건조 파스타와는 확연히 다른 식감과 맛을 지닌 생면 파스타. 아티잔 파스타의 선두주자 이준 셰프의 도우룸을 찾아 하얀 밀가루와 달걀노른자가 하나의 파스타면으로 재탄생하기까지의 생생한 과정을 담았다.
생면 파스타의 무궁무진한 매력
그런 식감의 파스타는 처음이었다. 완전히 다른 종류의 국수를 먹는 느낌이었다. 이탈리아를 여행하며 (아주 전형적인 관광객의 태도로) 제대로 된 파스타 한번 먹어야지란 생각에 들어선 식당에서 난생처음 생면 파스타를 만났다. 고백하건대 밀가루로 만든 음식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먹을 만큼 좋아했지만 이상하게도 파스타는 그렇지 않았다. 하지만 낯선 땅에서 새로운 파스타의 세계에 눈을 떴다.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새로운 파스타의 세계’란 말은 모순이다. 애초에 생면 파스타가 존재했고, 우리에게 익숙한 시판되는 건조 파스타는 유통을 위해 건조 과정을 추가한 것이니까. 아무튼 건조 파스타와 생면 파스타의 맛 차이는 확연하다. 뿐만 아니라 표현할 수 있는 식감과 맛의 범위조차 비교 불가하다.
일단 기본적으로 건조 파스타는 듀럼밀의 배아를 거칠게 갈아 만든 세몰리나와 물만으로 반죽해 만든다. 그러나 생면 파스타는 강력분이나 세몰리나를 기본으로 다양한 곡식가루를 취향대로 섞을 수도 있고 달걀 반죽, 노른자 반죽, 물 반죽 등 반죽에 들어가는 주재료에 따라 그 맛과 식감이 천차만별이다. 여기에 채소즙이나 생채소를 비롯해 다양한 부재료를 넣고도 반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표현할 수 있는 맛이 끝없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생면 파스타는 달걀을 비롯해 그날 사용한 재료들의 상태에 따라 맛이 변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어떤 보드 위에서 반죽을 치느냐, 그날 날씨가 어땠느냐 등에 따라서도 맛과 향이 미묘하게 달라진다. 그리고 얼마나 정성을 들이냐에 따라 맛의 수준이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때문에 대부분 소스의 맛에 의존하는 건조 파스타와 달리 면 자체의 맛에 집중할 수 있다. 정말 잘 만든 면이면 오일, 버터, 치즈 등 약간의 부재료만 가미해도 한 그릇의 근사한 파스타가 완성된다. 국내에서는 순서가 바뀌어 건조 면이 파스타면의 기본처럼 인식이 굳어졌지만 최근 속속들이 생면 파스타를 다루는 곳이 많아지며 생면 파스타의 매력에 반해 찾는 이들이 부쩍 늘고 있다.
새하얀 밀가루와 달걀노른자가 허브를 머금은 생면 파스타가 되기까지
‘오늘 만드는 과정을 보고 집에서 직접 해보면 좋을 텐데. 하지만 생면 파스타는 아무래도 좀 어렵겠지?’ 기자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이준 셰프는 나무 보드 위에 밀가루를 동그랗게 모으며 말했다. “파스타라는 음식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때문인지 다들 생면 파스타를 직접 만드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생면 파스타 만들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오늘 만들 파스타면은 ‘허브 압착 파파르델레’. 압착된 파슬리의 모양이 반투명하게 비치는 파스타다. 허브 압착 파파르델레는 강력분과 달걀노른자를 이용해 만든 반죽을 사용하는데 노른자로 반죽한 면의 고소함과 파슬리의 향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면이다. 반죽에 직접 파슬리를 갈아 넣은 것보다는 파슬리의 맛과 향이 약하지만 어느 부분을 씹느냐에 따라 파슬리의 향이 은은하게 배어나기도, 혹은 강렬하게 입안 가득 퍼지기도 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반죽의 시작은 제일 먼저 도넛 모양처럼 가운데를 비우고 동그랗게 쌓아 올린 밀가루 더미 중앙에 달걀노른자를 얹는 일이었다. 그리고 재빠르게 포크로 노른자를 저어 풀었다. “노른자를 푸는 것은 반죽 만들기의 가장 첫 단계인데 중요한 과정이에요. 처음 노른자의 멍울을 제대로 풀지 않으면 반죽이 제대로 뭉치지 않아요.” 재빠르게 포크로 노른자를 휘젓던 그는 어느 정도 노른자가 매끈하게 풀리자 주변을 동그랗게 싸고 있던 밀가루 더미를 조금씩 넣으며 계속해서 저었다. 그렇게 서서히 반죽이 제법 되직해지자 포크를 놓고 손으로 조금씩 주변에 남은 밀가루를 넣어가며 반죽을 하기 시작했다.
재빠른 손놀림에 넋을 잃고 바라보다 보니 금세 한 덩어리의 반죽이 되어 있다. “지금부터는 왕도가 없어요. 계속해서 치대야 해요. 반죽은 정직해요. 한 번이라도 더 치대면 그만큼 맛이 좋아요. 많이 치댈수록 재료들도 제대로 섞이고 쫄깃한 식감을 내는 글루텐 조직이 더욱 치밀해지거든요.” 말을 마친 이준 셰프는 양손 가득 들어오는 한 덩어리의 반죽을 가지고 씨름을 하기 시작했다. 체중을 실어 반죽을 눌러 펴고 다시 동그랗게 모으고 그렇게 치대기를 한참 반복하던 그가 입을 열었다. “여기 반죽의 표면 보이세요? 아까는 거칠었던 게 제법 매끄러워졌죠?”
그의 말을 듣고 다시 반죽의 표면을 찬찬히 보니 정말 그랬다. 아까까지만 해도 건조하고 푸석해 보였는데 어느새 매끈하면서도 윤기가 흐르는 반죽으로 변해 있었다. “이렇게 반죽에 윤기가 흐르기 시작하는 건 면으로 만들 수 있는 상태라는 신호예요. 물론 이건 만들 수 있다는 신호일 뿐 앞서 말했듯 이 상태에서도 반죽을 더 치대면 맛은 계속 좋아져요. 어느 정도 치댈지는 본인이 원하는 결과물에 달린 거죠. 원하는 만큼 치대고 나면 냉장고에서 숙성시켜야 해요. 밀가루가 수분을 머금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처음 반죽보다 조금 더 물러져요. 양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1~2시간은 숙성시키세요. 그러고 나면 반죽을 펴는 작업을 합니다.”

숙성 과정을 거친 반죽은 수분을 제대로 머금었는지 아까보다 덜 단단해 보였다. 제법 말랑말랑해진 반죽을 납작하게 만들더니 롤러에 넣고 반죽을 펴기 시작했다. 어느 정도 얇게 펴지자 반죽을 접어 다시 롤러에 넣어 늘리고 그렇게 나온 반죽을 다시 접어 롤러에 넣어 늘리기를 반복했다. “면을 만져보았을 때 단단하고 쫀쫀한 느낌이 날 때까지 반복하면 돼요. 자, 이제 허브 압착 파파르델레의 핵심인 허브를 넣을 차례예요.”
길게 늘어난 반죽의 반만 보드 위에 펼치고 그 위에 파릇파릇한 파슬리를 얹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정성스레 한 장씩 파슬리를 펴는데, 파슬리 두께가 일정하도록 잘 펴서 넣어야 나중에 면이 찢어지지 않는다고. 고르게 배열된 파슬리 위로 남아 있던 면의 반을 접어 덮은 후 롤러에 한 번 더 밀었다. 아까는 그렇게 접었다 밀었다 반복하더니 이번엔 왜 한 번만 미는지 궁금해 물어보니 허브를 넣은 후엔 한 번에 끝내는 것이 면에 구멍이 나지 않고 예쁘게 모양을 낼 수 있는 비결이란다. 흡사 녹색 실로 곱게 수놓은 비단과도 같아 보이는 면을 일정 크기로 네모나게 잘랐다.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돌돌 말아서 썰면 끝나요.” 잘라놓은 사각형의 면을 착착 쌓아 돌돌 말고 듬성듬성 써니 어느새 허브 압착 파파르델레가 완성되었다. 하얀 밀가루와 달걀노른자가 허브를 품은 파스타면으로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을 눈앞에서 직접 보니 놀라웠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직접 도전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자신감이 스멀스멀 고개를 들었다. “아까도 말했듯 생면 파스타를 만드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일반 가정에서도 종종 직접 밀가루로 반죽을 만들어 생면 칼국수를 해 먹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물 대신 달걀로 반죽했다 뿐이지.
기계가 없으면 밀대로 밀어도 돼요. 원하는 두께로 밀어서 썰면 정형화된 모양의 파스타면은 아닐지라도 나만의 파스타면이 되는 거예요.” 그의 말처럼 생면 파스타를 만든다 했을 때 지레 긴장했던 것은 스파게티, 링귀네, 파르팔레 등 우리에게 익숙한 모양의 면을 만들고 말겠다는 마음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생면 파스타를 만들 때 필요한 재료들을 찾아보며 생각했다. ‘난생처음 보는 모양이면 어때? 그것 역시 그 나름대로의 매력이지.’
이준 셰프는
경희대 조리과학과, 미국 CIA 요리학교를 졸업했으며 레스토랑 ‘퍼 세’와 ‘링컨’ 등에서 일하며 실력을 쌓았다. 현재는 컨템퍼러리 레스토랑 ‘스와니예’와 아티잔 파스타를 선보이는 ‘도우룸’의 오너 셰프이며 국내 아티잔 파스타 분야의 선두주자다.
건조 파스타와는 확연히 다른 식감과 맛을 지닌 생면 파스타. 아티잔 파스타의 선두주자 이준 셰프의 도우룸을 찾아 하얀 밀가루와 달걀노른자가 하나의 파스타면으로 재탄생하기까지의 생생한 과정을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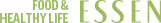










 0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