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콤함을 입에 채우면서 떠올릴 수 있는 사연이 생긴다는 것은 먹는 즐거움에 의미를 얹는 일이다.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랑스 디저트부터 오늘날까지 조금도 시들지 않은 옛 프랑스 디저트까지, 과거를 되짚어 이야기로 만나보자.
오페라
이탈리아에 티라미수가 있다면 프랑스엔 오페라가 있다. 오페라 가르니에의 프리마 발레리나(오페라로 치면 프리마돈나)에게 바친다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 유명한 파티스리 중 하나인 달로와요에서 처음 만들었다고 전해진다. 커피와 초콜릿 향이 교차하면서 깊은 맛을 내고 자로 잰 듯한 완벽한 켜에서는 건축미마저 느껴진다. 오페라는 윗면에 반드시 금박 장식이 들어가는데, 파리 오페라 극장의 돔이 금색이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다. 굉장히 클래식한 디저트라 프랑스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다. 국내 프랑스 디저트 카페에서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메뉴.
마카롱
매끄럽게 봉긋 솟은 표면과 쫀득한 식감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만만치가 않다. 오죽하면 마카롱 맛을 보면 그 제과점의 실력을 파악할 수 있다고 말할까? 마카롱은 원래 프랑스 낭시의 수도원에서 수녀들이 즐겨 만들어 먹은 과자다. 수녀들은 마카롱 만드는 법을 철저히 비밀에 부쳐왔는데, 전쟁이 일어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수도원에서 나와 몸을 피해야 했던 수녀들이 자신을 돌봐준 사람들에게 보답하고자 마카롱 만드는 법을 친절히 알려준 것. 그렇게 해서 마카롱 레서피가 프랑스 전역으로 퍼지게 됐고, 프랑스인들에게 사랑받는 대표적인 과자로 재탄생했다. 지금의 마카롱은 과거에 비해 훨씬 화려해졌다. 마지판이나 버터크림을 충전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과일 향이 나는 크림이나 초콜릿으로 만든 가나슈 등 충전물에 다양한 변화를 주면서 마카롱의 개념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프랑스 제과업계의 피카소로 불리는 피에르 에르메의 활약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평. 한국에서도 2014년부터 피에르 에르메의 창의적인 마카롱을 현대백화점 본점이나 판교점 등에서 맛볼 수 있게 됐다.
몽블랑
프랑스와 이탈리아 국경에 위치한 몽블랑 산과 닮은꼴이다. 얇은 국수 모양의 밤퓌레를 기특하다 싶을 정도로 정교하게 짜 올린 것이 특징. 부드럽고 진한 밤퓌레 속에는 하얀 생크림과 바삭한 머랭쿠키가 어우러져 달달함의 끝을 과시한다. 몽블랑의 시작은 1475년 이탈리아 플로렌스 지방의 한 요리책에 기록된 ‘몬테 비안코’에서부터다.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었지만, 1620년 프랑스로 넘어오면서 대중화되기 시작했다. 20세기 초 또 다른 디저트 강국 일본에 전파된 후로는 유럽보다 일본에서 더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일본 최고의 파티시에 츠지구치 히로노부의 디저트 숍 몽상클레르에 가면 굳이 프랑스에 가지 않아도 그 진가를 확인할 수 있다. 한 가지 팁. 전통 방식을 따른다면 작은 은수저를 사용해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금씩 떠먹어야 한다.
생토노레
칼과 포크를 들고 우아하게 양손으로 먹어야 할 것 같은 비주얼을 자랑한다. 생토노레는 1846~1847년 파리의 고급 상점가인 생토노레 거리에 있던 어느 과자점에서 만들어진 걸로 알려져 있다. 왕관 모양 브리오슈에 크렘파티시에르를 채운 이곳의 생토노레는 수분을 흡수해버려 2시간쯤 지나면 흐물흐물해졌다고 한다. 훗날 쥘리앵 파티시에 삼형제가 레서피를 조금 손봤다. 브리오슈 반죽 대신 잘 치댄 파이 반죽을 사용하고, 가장자리와 윗부분에 바삭하게 구운 반죽으로 만든 왕관 모양의 작은 슈를 놓아 바삭함이 오래가도록 했다. 티와 함께 환상적인 생토노레를 맛보고 싶다면 한남동 디저트 카페 르와지르로 향할 것을 추천한다.
파리브레스트
19세기 말, 프랑스 파리에서 브레스트 시까지 이어졌던 자전거 경주를 기념하는 디저트. 프랑스 유명 불랑제리인 라 투르 데 델리스의 제빵사 발렝탱이 경주를 구경하던 중 자전거 바퀴에 영감을 받아 만들었다고 한다. 슈 반죽으로 바퀴 비슷하게 모양을 만들고, 두 개의 바퀴(슈) 사이에는 구운 머랭과 프랄린(설탕에 조린 견과류 또는 견과류로 속을 채운 초콜릿)을 더한 버터크림을 채운다. 슈 위에 아몬드 슬라이스로 장식까지 마치면 자전거 바퀴 얘기는 머릿속에서 잊히고 그저 통통한 슈를 한 입 베어 물고 싶은 생각만 남는다. 방배동의 디저트 카페 메종엠오에서는 ‘파리브레스트 서울’이라는 특별한 파리브레스트를 맛볼 수 있다. 캐러멜 풍미가 나는 크림과 땅콩페이스트에 튀긴 현미를 더해 식감에 재미를 준 것이 특징이다.
를리지외즈
두 개의 슈를 이어 붙여 눈사람 같은 모양새가 귀여운 인상이다. ‘수녀’라는 뜻의 디저트로 베일을 쓴 수녀와 닮았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 를리지외즈는 1856년 파리의 셰 프라스카티라는 가게에서 맨 처음 만들었다고 한다. 커다란 슈 위에 작은 슈를 얹고 그 위에 녹인 초콜릿이나 커피를 흘리듯 부어 만드는데, 슈크림 2개가 겹쳐지는 부분에는 수녀복 목깃 부분의 레이스 모양을 본떠 버터크림을 얹는 것이 특징이다. 프랑스 라뒤레 매장에서 판매하는 를리지외즈는 특히나 완벽한 비주얼을 자랑하니 눈으로 먼저 감상해보길 바란다.
밀푀유
333겹의 푀이타주(파이지) 3장 사이사이 크렘파티시에르를 짜서 만든다. ‘1000장의 잎사귀’라는 뜻의 이름에 걸맞게 ‘켜의 예술’을 감상할 수 있다. 반죽을 얇게 밀어 접기를 수차례 반복해 굽는 밀푀유는 19세기 초 루제라는 파티시에가 생각해냈다고 한다. 소금기가 느껴지는 푀이타주와 달콤한 크렘파티시에르의 조합이 절묘해 많은 이들이 찬탄을 아끼지 않았다고. 밀푀유의 유래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헝가리의 세게드 지방에서 유래했다거나 루제가 아닌 앙토냉 카렘이 만든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하지만 뛰어난 수작업의 결과물이라는 것만은 누구든 동의할 것. 실패 없는 밀푀유를 맛볼 수 있는 국내 디저트 카페로는 밀갸또, 마얘, 오뗄두스를 추천한다.
에클레르
1822년 퐁당(설탕과 물을 섞어 걸쭉하게 만든 것)의 존재가 발견된 뒤 탄생한 디저트로 19세기 앙토냉 카렘이라는 프랑스의 유명한 파티시에가 처음 만들었다고 전해진다. 현재 에클레르는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열광하는 디저트. 에클레르는 프랑스어로 ‘번개’를 뜻하는데, 표면에 바른 크림이 빛에 반사돼 번개처럼 번쩍 빛나서 그렇다고도 하고, 한 입 맛보면 번개처럼 재빠르게 먹어치우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다. 기다란 슈 반죽 속에 사용되는 것은 보통 크렘파티시에르지만 다른 재료와 혼합해 색다른 크림을 사용하기도 한다. 에클레르 전문점 에클레어 드 제니의 파티시에인 크리스토프 아담이 포숑의 파티시에로 있을 때부터 감각적인 데코를 선보이면서 훨씬 패셔너블하게 변모했다. 맛뿐 아니라 컬러와 식감의 조화를 고려한 그의 에클레르가 유행을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달콤함을 입에 채우면서 떠올릴 수 있는 사연이 생긴다는 것은 먹는 즐거움에 의미를 얹는 일이다.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랑스 디저트부터 오늘날까지 조금도 시들지 않은 옛 프랑스 디저트까지, 과거를 되짚어 이야기로 만나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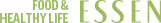










 0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