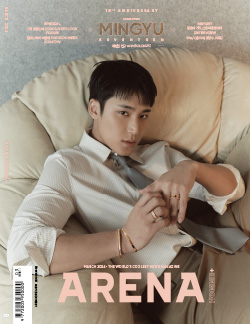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일이 인생에서 일정 비중을 차지하는 건 확실하다. 자신의 일에 따라 말투나 행동이나 세계관의 영향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자기 세계관의 일부일 섹스가 일의 영향을 받는다는 가설 정도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넣고 움직이는 건 똑같지 않냐고? 그럴 리가. 현대 축구도 주고 빠지는 게 전부가 아니라 공이 내게 오지 않을 때의 ‘오프 더 볼’ 무브먼트라는 게 있다. 섹스도 그렇다. 대화가 있고 애무가 있다. 애무의 도구마저도 혀와 손으로 시작해 한참 더 있다. 섹스도 간단하다면 한없이 간단하고 복잡하다면 한없이 복잡하다.
“발레를 취미로 하는 여자였죠. 제 로망이었습니다. 다소곳한 뉘앙스로 우아 떨기 좋은 취미.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가질 수 있는 취미라는 것도 모르지 않았죠.” 쇼핑몰을 운영하는 박주성(26세)은 어느 동양화가와의 만남을 떠올렸다. 그는 화가의 그림 이전에 취미를 말했다. 회화 전공보다 발레 취미에 더 끌렸을까? “동양화 그리는 여자의 취미가 발레인 게 가산점이었죠.”
“네 살 어린 여자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박주성은 그녀와의 추억이 생생했다. “혀로 내 혀를 잡아당기고, 길고 가는 다리로 내 몸을 감싸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진심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가끔 풀린 눈도 보여주고요.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 앞치마만 입거나, 원피스 안에 아무것도 안 입는 식이었어요. 클래식을 줄곧 따르다가 가끔 살짝 비틀었죠. 아름다우면서 본능적이기 어렵고 본능적이면 아름답기 어렵다고 보는데, A는 아름다우면서도 본능적이었어요. 그녀의 카톡 배경화면도 <원초적 본능>의 샤론 스톤이었습니다. 그녀를 따라 했던 걸까. 지능적이면서 아름다운 섹스를 매번 해내는 여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나이 많은 내가 좀 더 거침없고 싶은데, 매번 두 발 정도 늦었으니까.”
그는 자존심을 지키려다 자존심에 더 큰 상처를 입게 된다. “‘오빠의 자존심’ 같은 게 있었습니다. ‘네가 하는 정도의 섹스쯤은 내가 여유롭게 다룰 수 있다’는. 그래서 언젠가 물었습니다. 벗은 우리를 그려보는 거 어때? “이미 해봤지. 오빠 귀엽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귀엽다.’ 충격적이었죠. 낭만적이지도 않고.” 그냥 즐기면 좋을 텐데 젊은 남자는 그게 잘 안 된다. “그녀가 누드화를 수없이 그려본 경험은 자신감의 원천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기방어가 심해졌어요. 하고 싶은 걸 하자고 말하기 전에 ‘이걸 또 귀엽다고 하면 어쩌지?’라는 걱정이 먼저 들었으니까요.” 그는 화가에게 연락이 오면 또 맥없이 끌려갈 것 같다고 했다.
“직업과 섹스? 최소 100명은 인터뷰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의견 하나로 될까요? 음 그런데 골라 보세요. 의사, 증권맨, 디자이너, 취준생, 운동선수.” 불문학 전공 대학생 김미정(24세)은 경험이 많았다. 다양한 직군의 남자를 만난 걸 후회하진 않지만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조금 경험을 줄이고 순수한 대학생의 연애를 하고 싶다면서도, 그래도 그 경험 덕에 섹스 인터뷰를 해서 뿌듯하다고도 하는 젊은이의 모순을 품고 있었다. 아무튼 경험은 좋은 것이다. 그는 다양한 경험 끝에 ‘워섹밸’이라는 개념을 주창했다.
“‘일과 섹스의 밸런스가 있는 사람이 섹스도 잘했어요”라고 김미정은 정리했다. “의사나 증권맨 같은 전문직은 ‘싸기 위해’ 섹스를 하는 것 같달까요. 취준생이나 또래 대학생은 섹스를 너무 귀중하게 해. 온갖 정성을 기울이며 섹스를 열심히 하는 게 느껴졌어요.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그 사이에서 만난 한 디자이너는 일이 많이 없었어요. 섹스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지만 하면 또 즐겁게, 섹스를 정말 잘했어요. 성격 탓일지도 모르겠지만, 일의 종류보다는 일의 양이나 스트레스가 섹스에 영향을 미치는 걸까 싶었어요. 일의 양과 섹스의 질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이 삶에 영향을 미친다면 섹스에 영향을 미치는 건 당연한 일 아닐까요?”
김미정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 디자이너는 직업을 떠나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그 사람과의 섹스는 두 가지로 나뉘었어요. 플레이와 섹스. 술 취하면 플레이를 했어요. 때리거나 맞거나, 색다른 옷을 입거나 롤플레이를 하거나요. 술만 먹으면 항상 광대로 변했어요. 우아한 광대. 내가 딱히 원하는 걸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그대로 들여다보는, 무슨 말을 해도 웃긴 스탠딩 코미디언 같았어요. 뭘 해도 흥분했어요. 그 남자가 좋아서이기도 했지만 그가 나를 잘 흥분시키기도 했어요. SM 플레이도 낭만적이었어요. 맞는 것도 까먹을 정도로 좋았어요. 그런데 취했을 때는 삽입을 안 했어요.” 그러면? “삽입은 맨정신에만 했어요. 클래식하게. 앞으로, 뒤로, 다시 앞으로, 옆으로. 플레이와 정석 섹스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자극적이었죠. 심지어 그걸 잘했고요.” 김미정은 아쉬워했다. 그 남자와 연애는 하지 못했지만 섹스는 평생 할 수 있었을 것 같다며.
“그녀의 철학 전공이 연애를 결심한 이유의 전부는 아니었지만 이유 중 하나이긴 했습니다.” 영화 전공 이선구(25세)는 호기심이 많았다. 덩달아 궁금해졌다. 철학 공부하는 여자의 섹스는 다른가? 그게 무엇일지는 모르겠지만, 말하자면 좀 ‘철학적’인가? “철학적이었죠. 개인의 철학. 섹스할 때 다행히 신음 대신 라캉이나 푸코의 이론을 설파하진 않았지만, 그 여자는 자기가 상상하는 이상적인 섹스를 위해서라면 뭐든 가리지 않았던 거 같아요.” 이선구의 말도 철학책처럼 난해했다. 직설적으로 물어야 했다. 그래서 잘했나?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웃겼죠.” 이선구의 첫 경험은 사실 철학과 큰 상관이 없어 보였다. “첫 섹스는 모텔이 아닌 호텔에서 해야 한다는 제 나름의 철학 때문에 남산의 호텔에서 서로 차려입은 채로 만났습니다. 거기까진 좋았죠. 각자 적당히 씻고 누우려는데 여자가 갑자기 옷을 벗더니 나 안에 이거 입었다며 ‘섹시 간호사 코스튬 의상’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귀여운데, 그땐 싫은 쪽에 가까웠어요. 나는 이런 걸 입어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이런 걸 좋아할 거라는 기대로 입었다고 생각하니. 결국 3초 만에 벗겼습니다.” 이 이야기의 어디에 철학이 있나 싶어서 ‘각자의 철학이 있다’ 정도로 정리해야 했다.
“만날 때마다 편지를 받았죠. 소크라테스와 라캉, 마광수 등. 학교 철학 수업에서 배운 모든 이론이 담겨 있었어요.” 그녀와의 관계에서 철학은 의외의 모습으로 등장했다. 그게 이선구에게 큰 자극이 되지는 못했던 것 같다. “처음엔 좋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논문을 읽는 것 같았죠. 평생 들어보지도 못한 철학자들의 이름을 사귀는 동안 다 알게 됐죠. 편지는 뜯기지 않고 쌓여갔고, 여자를 향한 거부감도 마찬가지로 쌓여갔죠. 철학적 애티튜드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이해보다는 고집 쪽에 가까웠죠. 내가 맞고 네가 틀리다가 아닌, 자신의 고집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과몰입한 예술가 같았죠.”
각자 다른 방향으로 과몰입한 관계가 길게 갈 수는 없었다. “어떤 날은 강압적인 섹스를 하던 중에 여자가 ‘주인님!’이라 외쳤어요. 아래가 바로 수그러들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냐고 물어봤어요. ‘이런 거 원하는 거 아냐?’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런 걸 청하지 않았는데 어디서 어떤 영화나 책을 본 건지.” 그나저나 강압적인 섹스는 왜 했으며 어떻게 하는 건지 잠깐 궁금했지만 이 커플에 대해 더 묻지 않기로 했다.
“야, 야, 들어봐. 남자가 뭐 그리 피부가 좋아? 그래서 좋아한 것도 있는데, 더 짜증나기도 했어.” 패션 마케터 유성주(27세)는 내가 아는 여자 중 가장 말이 많다. ‘직업과 섹스’라는 주제를 듣자마자 역시 그녀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남자 피부가 좋은데 왜 짜증이 날까? “내 피부를 맘에 안 들어 할 것 같아서, 여기저기서 앰풀들을 가져오고, 모공 축소 프로그램을 짜줄 것만 같아서. 완벽한 메이크업 없이는 섹스하기 싫었어. 내 얼굴을 제일 가까이서 볼 테니까.” 말이 많아서인지 유성주는 상상력도 풍부했다. 안 그럴 수도 있을 텐데.
피부는 둘째치고 섹스는 마음에 들었을까? “반반. 사정을 잘 못 했어. 혼자 할 때만 사정할 수 있대. 섹스할 때는 긴장해서 잘 안 된다나. 사정을 안 하니 섹스를 오래 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 남자가 사정을 하지 않으니 ‘나랑 하는 게 안 좋나?’ 하는 생각이 들긴 했어. ‘자기가 보기에 내 피부가 안 좋아서 흥분이 안 되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유성주는 복잡한 표정으로 그때의 기억을 떠올렸다.
“주차장, 계단, 전화 부스, 탕비실.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했지.” 그 복잡한 관계는 상당히 파워풀했다. “시도하는 건 거침없었지. 근데 그 시도들마저 깨끗한 차 안, 카펫 깔려 있는 계단, 모든 면이 막혀 있는 전화 부스, 정리된 탕비실이어야 했어. 그것도 신경 써야 했지. 그 사람은 원래 으레 더러워야 할 공간이 깨끗할 때 희열을 느꼈나 봐. 그래서 내 겨드랑이를 좋아했는지도 모르고.” 자연스레 유성주의 겨드랑이가 어떤가 싶었지만 그것도 더 묻지 않기로 했다.
직업과 섹스의 관계는 직업과 자아의 관계와 비슷할 것 같았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이유로 그러지 못하거나 그러지 않는 사람도 있다. 섹스 역시 마찬가지다. 그림 그리듯 섹스를 하는 여자, 일과 섹스의 밸런스가 잘 맞는 남자, 미묘한 여자의 섹스 철학과 유독 깔끔한 남자의 섹스 위생 수칙은 각자의 일과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 적어도 자기 자신은 그 답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아레나옴므플러스>의 모든 기사의 사진과 텍스트는 상업적인 용도로 일부 혹은 전체를 무단 전재할 수 없습니다. 링크를 걸거나 SNS 퍼가기 버튼으로 공유해주세요.
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