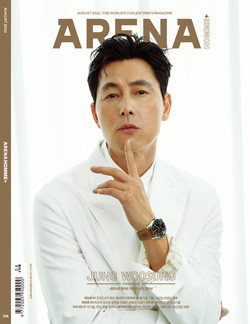예전 심리학과 학부생일 때 일이다. 성격심리학 커리큘럼의 기초인 ‘심리학 101’ 첫 수업 시간이었다. 성격심리학은 심리학과 새내기가 가장 기대하던 수업 중 하나였는데 인간의 성격을 파악하고 심중을 단번에 꿰뚫어볼 수 있는 마술적인 가르침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상상했기 때문이다.
교수님의 첫 마디는 기대와는 사뭇 달랐다. “OBT 같은 건 없습니다.” 오픈베타 서비스 얘기가 아니다. 사람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는 거대한 하나의 이론(One Big Theory)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성격이란 워낙 다양하고 변수가 많아 하나의 잣대로 측정하기엔 무리가 따른다. 그때그때 맞는 준거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심리학도가 갖춰야 하는 소양이라 배웠다.
최근 메타버스 유행을 보면서 OBT 얘기를 떠올린다. 회사들이 저마다 온 세상을 포섭할 수 있는 메타버스를 구축할 수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이다. 누구는 지구를 그대로 복사해 메타버스 내에서 구현하겠다 한다. 어떤 이는 이 세상 모든 게임이 마치 자신들의 메타버스 프로그램 안에서 구동될 것처럼 군다. ‘메타버스 고지’에 먼저 깃발을 꽂기 위해서 저마다 각자의 메타버스를 들고 질주하는 백가쟁명의 시대랄까.
이들이 ‘원 빅 메타버스’를 외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메타버스의 요체가 확장성과 교환성에 있기 때문이다. 가상현실을 소재로 한 공상과학 콘텐츠를 보면 발전된 메타버스가 어떤 모습인지 그려낼 수 있다. 서사는 대체로 이렇게 시작한다. 전 세계가 하나의 게임 또는 프로그램에 열광하고 사람들은 하나의 가상현실 내에서 상상하던 모든 것을 실현한다. 전사(前史)를 짐작하는 건 어렵지 않다. 아마 수십, 수백 개의 메타버스가 난립하다가 인수·합병(M&A)을 거듭해 먹고 집어삼키다가 가장 훌륭한 생태계 하나만이 살아남았을 것이다.
비유하자면 메타버스는 콘텐츠를 담는 그릇이다. 그릇이 그럴싸한 것은 큰 의미 없다. 사람들은 그릇을 구경하러 식당을 찾지 않는다. 그릇에 담긴 내용물이 풍성하고 맛있어야 손님을 끌어당길 수 있다. 메타버스를 구축하는 기술력과 경제 시스템이 시선을 잡아끄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 이용자를 메타버스에 체류하게 만드는 요인은 결국 풍부하고 즐길 만한 콘텐츠에 달린 것이다.
자본력이 우수한, 예컨대 메타(구 페이스북) 같은 거대 기업이 곧 메타버스의 최강자로 올라서게 될까. 단언하기 어렵다. 역사는 2022년을 메타버스의 태동기로 기록할 것이다. 메타버스가 무엇이고 또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규정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
메타버스 시장을 노리는 빅테크 기업들은 많지만, 일개 회사가 메타버스의 틀과 콘텐츠를 전부 구비하기엔 요구되는 리소스가 너무 크다.
메타는 가상현실 기기 분야 선두 주자지만 정작 메타버스 안에 집어넣을 콘텐츠를 자체 생산하기엔 경험이 충분치 않다. 에픽게임즈, 소니 등 게임사는 아바타와 경제 시스템 등 콘텐츠 분야에서 전문성을 띠지만 이를 가상현실로 구현하는 기술과 자본력이 부족하다. 인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트(MS) 등 굴지의 IT 기업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콘텐츠, 기술, 플랫폼, 디바이스 등 메타버스 관련 역량을 두루 갖춘 기업은 현재로선 찾기 어렵다. 메타버스 선두 기업이 되기 위해선 경쟁자와 협업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진 형국이다. 백가쟁명에서 합종연횡으로 전환하는 셈이다.
최근 발족한 ‘메타버스 스탠더드 포럼(MSF)’의 탄생 배경도 협업에 있다. MSF는 1백80곳의 주요 구성사와 2백90여 곳의 참가사 등으로 구성된다. 면면을 살피면 내로라하는 MS, 구글, 인텔, 소니, 메타 등 글로벌 기술 기업들이 총망라돼 있다. 영리기업 외에 다양한 분야의 표준개발기구(SDOs)들도 MSF에 참여한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원활한 협업을 위해선 소통 방식의 통일이 선행돼야 한다. MSF는 메타버스 관련 기술의 상호운용성을 증진하기 위해 스탠더드(표준)를 합치시키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쉽게 말하자면 프로젝트 내용을 교류하는 전자문서 양식으로 PDF를 쓸지 한글 워드를 쓸지 일단 합의하겠다는 소리다.
MSF는 국제표준화기구(ISO) 같은 거창한 메타버스 표준화 단체가 되길 원하진 않는 듯 보인다. 우선 메타버스 용어와 관련 기술의 가이드라인에 대해 연구하고 관련 내용을 주기적으로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메타버스 전체가 아닌 소분야로 나눠 기업과 단체가 프로젝트마다 유기적으로 뭉치고 흩어지는 유연성 있는 형태다.
궁극의 메타버스는 현실의 매력적인 복제판을 구현하는 것과 다름없다. 현실 세계의 복잡성을 생각해보면 메타버스 역시 단 하나의 규격을 제정하고 여기에 맞춰 각사의 기술을 조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비효율적인 일일 것이다.
정말 중요한 얘기가 남아 있다. 그래서 MSF의 탄생은 소비자인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변화는 점진적이고 비가시적일 가능성이 높다. 일반 소비자 중에 스마트폰이 작동하는 방식에 관해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아마 스티브 잡스도 100%는 설명이 불가능할 거다. 달에 착륙했던 아폴로 11호에 쓰인 컴퓨터 기술보다 요즘 스마트폰에 녹아 있는 기술 수준이 더 높다니 말이다. 스마트폰 게임 하나가 작동하기 위해선 유니티 엔진과 그 저변에 깔린 수많은 코드와 수십 회사들로부터 사온 그래픽 에셋, 파워시스템과 인간의 손으로는 이뤄낼 수 없는 세밀한 칩셋 반도체의 집적 공정, 온라인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통신 기술이 필요하다. 효용을 체감하기 위해 기술 이해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면 그 자체로 이미 대중성을 갖추지 못한 실패작임을 자인하는 꼴이다.
인수분해도 가물가물한 ‘문돌이’도 즐길 수 있어야 팔 수 있는 상품이 된다. 걱정은 접어두고 괜찮은 메타버스 앱에 ‘현질’할 지갑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소비자가 메타버스 생태계에 기여하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닐까 싶다.
<아레나옴므플러스>의 모든 기사의 사진과 텍스트는 상업적인 용도로 일부 혹은 전체를 무단 전재할 수 없습니다. 링크를 걸거나 SNS 퍼가기 버튼으로 공유해주세요.
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