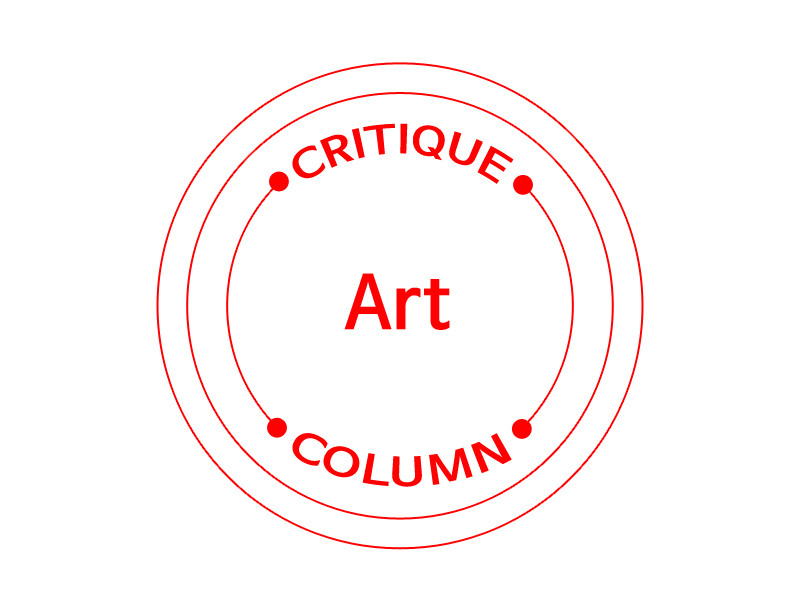많은 이들은 공공미술(公共美術)을 ‘건축 속의 미술’과 ‘공공 공간 속의 미술’로 이해한다. 수용자들이 조각 작품을 만드는 데 참여하거나 붓을 쥐고선 예술가와 같이 벽화를 그리면 그것이 곧 공공미술이요 지역 문화 공동체의 예술적 실현으로 안다. 심지어 자신의 작업을 공공 공간으로 옮기는 것을 공공미술로 오해하는 작가들도 있다.
건축 속의 미술과 공공 공간 속의 미술은 좋게 말해 ‘건축물 및 공간에 미술을 효과적으로 대입하는 방법’이지만, 거칠게 표현할 경우 건축물과 공공 공간을 도구화하는 미술이다. 둘의 공통점은 건축물과 특정 공간을 ‘장식’한다는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 그 배경엔 법과 미술에 대한 근대적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한국에는 ‘건축물미술작품법’이라는 게 있다. 1만㎡ 이상 건축물을 신축 및 증축할 경우 건축 비용의 0.7% 이하를 반드시 미술 작품 설치에 사용해야 한다는 게 요지다.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민간 건축주들도 예외는 아니다. 싫든 좋든 미술품을 설치해야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본질은 사유재인데 공공재라는 무게를 강요하는 이 희한한 제도는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 제정 당시 권장 사항으로 출발해 1995년 의무화됐다. 작가들의 생존권 보장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민생고 해결,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과 도시 환경 개선을 구실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명분과 달리 이 제도는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연간 1천억원대로 시장이 커지자 거간꾼들이 끼어들었고, 그 결과 한국의 공공미술은 특정 단체나 기업 이익을 위한 공공조형물 ‘사업’으로 둔갑했다. 심사위원 매수, 이면 계약 등의 비리가 넘쳐나면서 사회적 폐해도 예사롭지 않다.
문제는 공공미술이 사업화되면서 도시마다, 빌딩마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조형물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다는 점이다. 작가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지도 못한다. 때문에 건축물미술작품법은 시효를 다 한, 공공미술의 의미를 왜곡하는 ‘악법’으로 꼽힌다.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한국의 정치인들은 임기 중 무언가를 남기려는 DNA가 있지 싶다. 그런 그들에게 공공미술을 빙자한 조형물이나 벽화 사업은 매우 효과적이다. 근대적 미의식의 산물인 ‘지역 상징 조형물’도 그중 하나다.
지역 상징 조형물은 건축물미술작품법과는 상관없다. 그럼에도 지자체들이 상징 조형물 건립에 혈안인 데에는 자치단체장의 임기 중 성과주의와 근거 없는 경제 진흥 낙관론이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고 조형물만 세우면 관광·홍보·경제 활성화가 절로 될 거라 믿는 것이다. 눈에 띄니 뭔가 그럴싸하게도 보인다.
하지만 대부분은 무관심의 대상이자 세금 낭비의 전형으로 남는다. 실제로 2016년 약 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세운 경북 군위군의 ‘대추화장실’은 한국에서 가장 비싼 공중화장실 겸 조형물이다. 특산품인 대추를 홍보하기 위해 만들었다. 강원도 고성군의 ‘항아리 조형물 겸 건축물’의 처지도 비슷하다. 논두렁에 똬리 튼 이 16m짜리 기괴한 조형물엔 무려 15억원에 달하는 혈세가 투입됐다. 하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유휴 공간으로 변했고, 당연히 관람객도 없다.
이 밖에 밥도 못 짓는 괴산군의 ‘대형 무쇠 솥’(약 5억원)을 비롯해, 가수 싸이조차도 불편해했다는 서울 삼성동의 ‘싸이 말춤 조형물’(4억원), 성의 상품화라는 논란에 휩싸인 강원 인제군 소양강 둔치의 황금 ‘마릴린 먼로 동상’(5천5백만원) 등도 세금 누수의 대표적 사례다. 인천의 ‘새우 타워’(10억원), 전북 고창군의 ‘주꾸미 미끄럼틀’(약 5억원) 등도 예외는 아니다. 모두 내 돈이라면 저랬을까 싶은, ‘악명’ 자자한 것들이다.
‘악명’을 떨치고 있는 공공미술에는 정부 사업도 있다. 바로 문체부와 전국 2백28개 지자체가 함께 진행 중인 ‘우리 동네 미술’이라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다. 세금만 무려 약 1천억원이 사용됐다. 사업 종료는 2021년 2월이다.
겉으론 코로나19로 힘든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지만, 현장은 급조된 정책의 전형인 ‘졸속’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작가 공모부터 사업 종료까지 고작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도 그렇고, 지역성이 충분히 연구되지 않아 온통 조형물과 벽화로 도배되다시피 한 결과물도 그렇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공미술의 본령인 공공의 장에서 미술을 매개로 대중과 현대미술, 시대적 사안에 대해 논하는 건 언감생심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조형물만 쌓이는 현상만 부채질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사례는 한국 공공미술의 현주소다. 안타깝게도 동시대 공공미술의 지향점과 거리가 있다. 그렇다면 공공미술의 올바른 방향은 무엇일까. 일단 방향을 논하려면 공공미술의 핵심, 즉 공공미술은 보편적인 미적 질서나 전체로서의 ‘공중’이 아닌 살아 있는 수많은 다른 ‘공중’과 그들의 다른 감수성을 발견하는 과정이라는 것, 특정한 문제와 사안, 자신의 주변 환경에 대해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주체로서의 경험에 가치를 둔다는 것부터 이해해야 한다.
또한 미술을 매개로 어떻게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동화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예술가들의 고민이 공공의 주체인 시민에 의해 승화되는 과정과 그 결과가 바로 공공미술임을 상기해야 한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공공성’이고 그것의 실천이 ‘공공성의 실현’이다. 공공미술에서 미술은 그 공공성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미적 매개다.
공공미술의 방향은 공공미술과 공공성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공공 공간에 미적 가치가 있는 오브제를 어떻게 가져다 놓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어떻게 사람들의 삶에 참여하고 개입해 유익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전환하는 데서 시작된다.
물론 그 실천 방법으론 예술을 통해 지역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명확한 태도 아래 어떤 형태로든 공중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구성원 전체의 기억과 쟁점, 삶의 맥락을 수용한 문화적 매개로서 공공미술이 가능해진다.
공공미술의 궁극적 목표인 ‘미술을 통한 상상력의 확장과 사고의 지평을 통한 새로운 모더니티 창출’ 역시 이룰 수 있다. 지금같이 온 국토를 쓰레기 같은 조형물과 지저분한 벽화로 덮는 양태로는 절대 다가설 수 없는 영역이다.
<아레나옴므플러스>의 모든 기사의 사진과 텍스트는 상업적인 용도로 일부 혹은 전체를 무단 전재할 수 없습니다. 링크를 걸거나 SNS 퍼가기 버튼으로 공유해주세요.
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