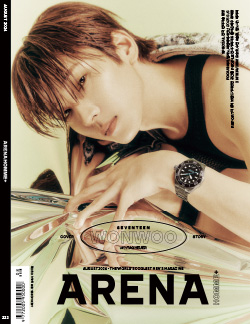밀라노 말펜사 공항에서 북쪽으로 차로 한 시간. 그곳에 스트레사라는 작은 마을이 있다. 낯선 이름이다. 스트레사에서는 한국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이번 출장 목적지가 스트레사임을 듣고, 가장 먼저 한 일도 유튜브에 ‘스트레사’를 검색하는 것이었다. 침대에 누워 유튜버가 전 세계 오지에서 담아온 여행기를 찾아볼 수 있는 시대가 됐지만, ‘스트레사 3박 4일 브이로그’ 같은 제목의 영상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나는 공항에 마중 나온 이탈리아인 알렉산드로에게 물었다. 스트레사는 이탈리아인에게도 유명합니까? 그가 답했다. “그럼요. 아주 유명합니다. 마조레 호수가 있으니까요.” 알렉산드로는 밀라노에서 나고 자랐다. 그는 성인이 된 후 도쿄로 넘어가 와세다대학을 졸업했고 첫 직장으로 마세라티에 입사했다. 밀라노 출신 와세다대학 졸업생과의 대화가 전날 있었던 뉴진스 도쿄돔 콘서트에 이를 때쯤, 우리는 마조레 호수 왼편의 스트레사에 도착했다.
스트레사는 이국적이었다. 단순히 건조한 햇살과 낯선 건축양식 때문만은 아니었다. 길거리의 할아버지들은 양말에 샌들을 신은 채 할머니 손을 잡고 다녔다. 호수에는 소금쟁이 대신 백조가 있었고, 아무도 래시가드를 입지 않았다. 그리고 스트레사의 누구도 아이스아메리카노를 찾지 않았다. 저녁 식사를 앞두고 한국, 일본, 멕시코, 이탈리아 기자들이 호텔 정원에 모였다. 그곳에는 마세라티 두 대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마세라티 3500GT 스파이터와 그란카브리오 폴고레였다. 3500GT는 레이싱카를 만들던 마세라티가 최초로 대량생산한 로드카다. 그럼에도 한국에서는 아주 보기 힘든 모델이다. 3500GT는 시종일관 눈길을 끌었지만 이날 주인공은 따로 있었다.
그란카브리오 앞에는 말끔하게 다린 리넨 수트 차림에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서 있었다. 마세라티의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커뮤니케이션 매니저, 마리오 판자리노다. 그는 온화한 미소와 함께 두 팔을 벌리며 인사를 건넸다. 문득 그가 비행기를 타기 전 보낸 메일이 떠올랐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인간의 천재성과 선구적인 기술이 만난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마세라티 팀의 혈관에 흐르는 열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 열정을 온몸으로 느껴보기까지는 아주 긴 저녁 식사와 짧은 밤이 남아있었다.

더 멀리, 더 편안하게, 더 풍족하게
아침 일찍 호텔 로비를 나서자 등 뒤로 프런트 직원이 인사말을 건넸다. 그는 ‘차오(Ciao)’ 대신 ‘인조이 더 선(Enjoy the sun)!’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타게 될 그란카브리오는 두 가지. 그란카브리오 트로페오와 그란카브리오 폴고레였다. 이탈리아어로 트로페오는 ‘트로피’를, 폴고레는 ‘번개’를 뜻한다. 두 차는 프런트 그릴과 리어 스포일러를 자세하게 살피지 않으면 겉으로 큰 차이를 느끼기 어렵다. 하지만 두 차는 완전히 다르다. 트로페오는 내연기관, 폴고레는 전기차다. 트로페오의 기다란 보닛에는 V6 네튜노 트윈 터보 엔진이 올라간다. 최고 550마력의 힘을 내는 네튜노 엔진은 8 단 자동변속기와 맞물려 네 바퀴를 굴린다. 정지 상태에서 100km/h 까지 걸리는 시간은 3.6초. 폴고레는 숫자만 놓고 보면 더 빠르다. 최고출력은 761마력, 100km/h 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2.8초면 충분하다.
내가 더 기대하는 쪽은 트로페오, 더 궁금한 쪽은 폴고레였다. 먼저 운전대를 잡은 건 폴고레. 운전대를 잡고 마조레 호수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달리며 느낀 첫인상은 ‘편하다’였다. 누군가는 그 편안함에 실망할 수도 있다. 2억원이 넘는 마세라티라면 편안함보다는 강렬함을 기대할 수도 있을 테니까. 하지만 조용하고 편안하다는 점이 그란카브리오를 설명할 때 단점으로 거론될 수는 없다. 그란카브리오는 컨버터블 GT 모델이다. GT, 즉 그란투리스모는 처음부터 ‘장거리를 빠르고 편하게 달릴 수 있는 고성능 차’를 칭하는 장르다. 그리고 마세라티는 GT카를 가장 오랫동안 만들어온 자동차 브랜드 중 하나다. 그란카브리오 역시 더 멀리, 더 편안히, 더 풍족히 달리는 데 초점을 맞춰 만들어졌다. 마세라티 특유의 맹렬한 엔진음은 약해졌지만, 햇살과 풍경을 즐기며 국경을 넘는 차로서는 모자람이 없었다.
트로페오로 운전석을 옮겼을 때, 목적지는 모타로네산 정상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스트레사 뒤편에 솟아오른 모타로네산으로 향하는 길은 장엄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다면 이렇게 생겼겠구나. 기다란 보닛 위로는 초록색 언덕과 새파란 하늘만이 시야에 들어왔다. 신형 그란카브리오는 네 가지 주행 모드를 탑재했다. ‘컴포트’ ‘GT’ ‘스포츠’ ‘코르사’. 나는 내리막길에 접어들면서 주행 모드를 코르사로 바꾸었다. 왼쪽 패들시프트를 당길 때마다 모타로네산에는 V6 엔진 사운드가 울려 퍼졌다. GT카 위에 얹은 소프트톱은 파스타 위에 올린 트러플버섯 같은 존재다. 지붕을 열지 못해도 나름대로 근사할 테지만, 지붕을 연다면 ‘인조이 더 선’ 하기에도, ‘인조이 더 사운드’ 하기에도 좋을 것이다. 참고로 그란카브리오는 최고 50km/h로 달리는 중에도 버튼 하나로 14초 만에 지붕을 열 수 있다.

물살을 가르는 삼지창
마세라티 삼지창 엠블럼은 전 세계에서 유명한 로고 중 하나다. 마세라티는 1914년 볼로냐에 처음 브랜드를 세울 때부터 ‘트라이던트’를 엠블럼으로 사용해왔다. 하지만 한편으로 도로 위 마세라티를 볼 때마다 의문이 들었다. 요트 브랜드가 아닌 자동차 브랜드에서 왜 하필 포세이돈의 삼지창을 내세웠을까? 볼로냐 광장에 포세이돈 동상 분수가 있다는 점을 생각해도 의아하긴 마찬가지였다. 마세라티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걸까? 사연은 알 수 없지만 이제는 물 위에서도 마세라티를 탈 수 있다.
그란카브리오 주행이 끝나고 우리는 조그만 선박장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트리덴테’라는 이름의 요트가 기다리고 있었다. 트리덴테는 마세라티 최초의 전기 요트다. 길이가 10.5m에 달하는 트리덴테는 전기 요트답게 어떤 소리도 매연도 없이 물살을 갈랐다. 목적지는 마조레 호수 한가운데 떠 있는 이솔라 마드레. 이솔라 마드레는 전 세계의 희귀 식물을 공수해 꾸민 수상 정원이다. 섬에 다다랐을 때는 고요함 속에서 절벽을 따라 빼곡한 나무들을 올려다보았다. 익숙한 풍경과 낯선 사람에게서 벗어나 시시각각 바뀌는 절경을 눈으로 담는 것. 요트가 럭셔리의 정수로 통하는 이유도 비슷한 맥락이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탈리아 럭셔리’를 주창하는 마세라티라면 ‘물 위의 마세라티’는 일찍이 계획된 미래였구나.
스트레사로 돌아갈 무렵에는 호수가 노을빛에 물들었다. 함께 배에 올라탄 이탈리아인도 스마트폰을 꺼내 들어 셔터를 눌러댔다. 마세라티를 타고 산을 넘고 호수를 건너며 보낸 하루는 이탈리아인에게도 특별한 모양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아침부터 줄곧 궁금했던 질문을 건넸다. 뷰티풀은 이탈리아어로 어떻게 말합니까? 밀라노에서 왔다는 한 이탈리아인 기자가 웃으며 말했다. “벨리시모(Bellissimo)! 우리는 벨리시모라고 해요.” 그래. 벨리시모. 내가 오늘 본 것들은 하나같이 벨리시모 했구나. 다시 스트레사에 오기까지, 또 마세라티를 타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다. 다만 그때까지 ‘벨리시모’라는 말을 잊을 일은 없을 것 같다.
<아레나옴므플러스>의 모든 기사의 사진과 텍스트는 상업적인 용도로 일부 혹은 전체를 무단 전재할 수 없습니다. 링크를 걸거나 SNS 퍼가기 버튼으로 공유해주세요.
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