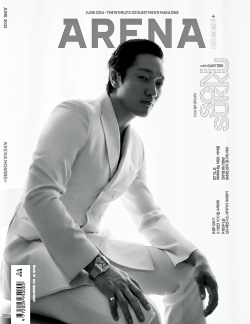폴로 유니버시티 클럽 네이비 블레이저
폴로 유니버시티 클럽은 1980년대 초부터 1990년대 초까지 잠깐 등장했다 사라진 폴로 랄프 로렌의 서브 레이블이다. 그렇다고 수집 가치가 있는 옷은 아니고 몇몇 애호가의 소소한 즐거움, 딱 그 정도다. 당시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적당한 품질의 옷을 내놓았는데, 그 ‘적당함’이 아주 좋다. 기본은 잘 지켰지만 필요 이상의 기교도 과시도 없는. 이 미국산 네이비 블레이저는 적당 그 자체다. 투박한 버진 울로 만든 것도, 말 그대로 ‘레귤러’한 핏도. 이 옷을 아끼는 이유.
프리랜스 에디터 & 스타일리스트 박태일
-
닥터마틴 빈티지 부츠
구입한 지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내게 오기 전에 이미 오랜 세월을 보낸 부츠다. 선물 사러 닥터마틴 매장에 갔다가 반짝이는 새것들 사이 구석에서 발견했다. 농부가 신을 듯한 디자인의 부츠는 판매용은 아니었고, 사장님이 런던 빈티지 숍에서 구입해온 제품이었다. 그걸 굳이 찾아내버려서, 사장님은 처음에 잠시 당황스러워했지만 마음에 들면 판매하겠다고 오래된 부츠를 기꺼이 내줬다. 스코틀랜드풍 체크 안감과 러버 소재 아웃솔, 멋지게 낡은 베이지색 가죽은 청바지, 스웨트 팬츠, 버뮤다 쇼츠 등 어디든 어울린다. 그러고 보면 내가 가진 물것들이 대체로 이렇다. 반짝이고 빛나는 것보다 낡고 편안한 것. 그 위에 내 시간을 더하는 식.
모델 홍태준 -
페르솔 스퀘어 프레임
언제부터였는지 정확히 헤아릴 수 없지만, 족히 12년은 되었을 거다. 한창 빠져 있는 러닝용, 고글형 디자인이라거나 눈꼬리를 바짝 치켜뜬 캐츠아이 등 새 선글라스를 써보기도 하지만 결국엔 페르솔로 돌아온다. 새로운 건 금세 질리고, 어느 날은 새삼 요란해 보이기도 하는데, 페르솔은 변함없이 고고하다. 요즘 재기 발랄한 새로운 브랜드가 넘쳐나지만, 100년이 넘은 이 브랜드의 유려한 실루엣과 견고한 오리지널리티엔 견줄 수가 없다. 지극히 모범적인 스퀘어 프레임은 어떤 상황에도 유난스럽지 않고, 적절한 품위와 근본 있는 쿨내를 유지한다. 무엇보다 마르고 선 굵은 내 얼굴형에 제격이다. 결정적으로 페르솔이니까, 대체안이 있을 수 없다.
화가 김영진
빈티지 밴드 티셔츠
밴드 음악을 좋아하고 밴드 보컬이나 아티스트의 쿨한 스타일을 좋아하다 보니 비슷한 빈티지, 밴드 티셔츠를 찾아보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생겼다. 주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아티스트들의 투어 티셔츠나 희귀한 그래픽을 선호한다. 옷장엔 빈티지, 밴드 티셔츠가 대부분. 그중 어렵게 세 장을 선별했다. 오리지널 밴드 티셔츠를 판매하는 단골 빈티지 숍이 있는데, 하도 자주 가니까 사장님이 잘 어울릴 거 같다고 선물해주신 게 검은색 티셔츠. 색감도 그래픽도 마음에 들어서, 정말 자주 입는다. 블론디 투어 티셔츠는 로커빌리아 제품인데, 슬림 핏이 아주 마음에 든다. 제일 밑에 있는 건 빈티지가 된 라프 시몬스. 색감, 핏 모두 완벽하다.
모델 채종석
-
샤넬 뿌르 무슈
‘돌고 돌아 샤넬’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온갖 세련되고 첨예한 향의 세계 속에서 보다 ‘근본적인’ 남성 향수를 찾다 결국 고전 중의 고전, 샤넬 뿌르 무슈를 몇 병째 쓰고 있다. 1955년 코코 샤넬이 만든 최초이자 마지막, 남성을 위한 향수. 물론 현행 버전은 현대적인 터치가 슬쩍 가미되었겠지만, 그가 정립한 샤넬적 신사의 이미지는 가늠해볼 수 있다. 시트론으로 시작해 생강처럼 저릿하고 청결한 향이 톡 쏘듯 거치면 라벤더와 베티베르, 오크 모스가 포근하게 스며든다. 지중해의 풍요로운 휴양지와 우아한 신사가 금방 떠오른다. 감히 내가 이걸 써도 될까 싶을 만큼 정석적인 신사의 향. 피부와 옷과 침구와 공간에 마구 뿌리다 보면 마치 이 향에 걸맞은 품위와 여유를 가진 듯한 우쭐한 착각에 빠지게 된다.
프리랜스 에디터 & 스타일리스트 고동휘 -
폴로 셔츠
처음으로 폴로 셔츠를 산 건 중학교 1학년 때. ‘두산에서 수입하던 때’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나랑 연배가 비슷할 거다. 10만8000원 하던 시절. 디키즈 874 팬츠, 리바이스 엔지니어드 진에 교복처럼 입으며 한 장, 두 장 사 모으던 게 지금까지 이어졌다. 한여름 빼고 다 입을 수 있으니 사실상 교복보다 더했지. 단정한 패턴이나 색감은 아버지와 함께 입기도 해서, 그 덕분에 더 많이 살 수 있었다. 얼마 전 본가에서 예전에 입던 셔츠를 몇 개 가져오기도 했다. 지금 봐도 이상한 구석 하나 없는 완전한 디자인. 촬영한 셔츠는 2년 전 빈티지 숍에서 구입한 것. 나이 들면서 밝은 옷이 없기도 하고, 지금은 없는 오버사이즈 핏이 좋기도 하고, 오른쪽 하단에 보일 듯 말 듯한 포니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샀다.
사진가 채대한
-
롤렉스 익스플로러 1
직장을 관두고 내 사업을 시작하면서 뭔가 기념할 만한 걸 갖고 싶었다. 시간을 잘 활용해보자는 구태의연한 의미보다는 돈이 생기니까 평소 가지고 싶었던 걸 하나 큰맘 먹고 샀다는 게 더 맞다. 그게 롤렉스 익스플로러 1이었다. 36mm 스틸 114270 모델인데 ‘구구익스’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나도 다른 남자들처럼 브래드 피트가 착용한 사진을 보고 이 시계를 열망했고 구입한 후로 데일리 워치로 꾸준히 차고 있다. 브레이슬릿이 지루해지면 레더 스트랩으로 바꿔보기도 하고 여름엔 나토 밴드로 바꿔도 잘 어울린다. 이후에도 다른 시계를 몇 개 구입했지만 이 시계만큼 어디에나 무난히 잘 어울리고 편한 시계가 없다.
프리랜스 에디터 & 스타일리스트 이영표 -
처치스 싱글 스트랩 슈즈
아마도 10년도 전에 선물받은 것 같다. 군더더기 없이 매끈하고, 싱글 스트랩 슈즈의 표본 격인 디자인은 언제 어떻게 신어도 빈틈이 없다. 그중에서도 심플한 데님 팬츠에 신는 걸 가장 선호한다. 그리고 처치스가 얼마나 견고하냐면, 이렇게 보시다시피. 10년 넘게 아무런 관리도 하지 않았는데 여전히 짱짱하다. 물론 세월의 흐름과 사용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지만, 워낙에 잘 지은 슈즈라 그건 또 그것대로 묵직한 멋이 되었다.
사진가 목정욱
-
리바이스 501
클래식 아이템이라. 첫 번째로 떠오른 건 리바이스 501 데님이다. 501이야 뭐 누구에게나 클래식의 범주에 들겠지만 수많은 라인 중에서 ‘93’을 뽑고 싶다. 1993년도에 나온 데님의 실루엣을 재해석해 501 데님치곤 밑위가 짧고 테이퍼드에 가까운 실루엣 덕에 다리가 길쭉해 보인다고 해야 하나? 무엇보다 나름의 합리적인 가격이라 컬러별로 구매했다. 어쨌거나 다다익선, 사시사철 입기 좋고 휘뚜루 활용하기에 최소 90점 이상 주고 싶다. 단종되지 말고 계속 나와줬으면 좋겠다. 물론 세일도 자주 해주길.
<아레나> 디지털 에디터 차종현 -
토드 스나이더 챔피언 샘플 후디
빈티지 옷은 젊은 몸에 어울린다. 몸이 늙었는데 늙은 옷까지 입으면 두 배로 늙어 보인다. 빈티지 숍 거울 앞에서 이 깨달음을 얻고 내 의생활이 새 국면으로 넘어갔다. 나와 함께 늙어갈 새 옷을 찾아야 했다. 그러던 중 맨해튼 어딘가의 유방암 기금 모금 자선 상점에서 이 옷을 찾았다. 토드 스나이더와 챔피언의 협업 모델. 샘플만 뽑아보고 출시를 안 했는지 새 옷인데 가격이 신품의 3분의 1이었다. 더 좋았다. 챔피언 후디는 언제든 비슷하게 생긴 이 시대의 클래식 같은 옷인데 색깔도 다른 곳에 없을 테니. 잘 사와서 잘 입고 있다. 이 옷과 함께 잘 늙고 싶다.
<아레나> 피처 디렉터 박찬용
<아레나옴므플러스>의 모든 기사의 사진과 텍스트는 상업적인 용도로 일부 혹은 전체를 무단 전재할 수 없습니다. 링크를 걸거나 SNS 퍼가기 버튼으로 공유해주세요.
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