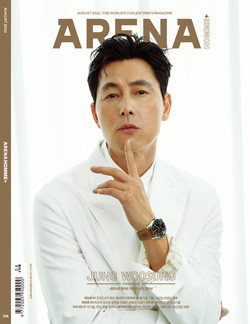BALANSA
부산에 요새를 둔 편집숍 발란사의 김지훈 대표는 이것저것 모은다. 장난감, 의류, 레코드 바이닐, 갖고 싶으면 수량 상관없이 모으는 습관이 김지훈을 발란사로 이끌었다. 그는 트렌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리복, 비바 스튜디오, 마리 떼 프랑소와 저버 같은 의류 브랜드와 협업하다 이제는 이마트, 카스, 태극당, 케이스티파이 등 경계를 허물고 다양한 협업을 시도하는 발란사다. 사운드 숍 발란사의 로고 폰트와 어린 시절 브렛 켈리 얼굴에 김지훈 대표 눈을 합성한 이미지가 대중의 뇌리에 박히지 않는 게 비범한 일이 될 정도로 도드라진 활동을 선보인다. 어느새 스트리트 문화의 한 축으로 거듭난 발란사의 대표 김지훈은 2008년, 부산의 홍대 ‘경대’에 둥지를 틀었다. 카시나에서 세일즈 업무를 담당했던 그에게 고정 수입이 부재한 홀로서기는 대단한 일이 아니었다. 발란사를 통해 관심사를 공유하고자 하는 갈증의 대가는 성공을 향한 욕심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어릴 적부터 수집병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주신 우표를 시작으로 수집해온 세월만 30년이에요. 문구류, 의류, 오브제, 잔. 갖고 싶은 것이라면 그저 사들였어요. 이 물건들로 발란사 공간을 꾸몄고 판매할 제품은 미국이나 일본에서 수입했어요. 조건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였죠. 직접 제작한 제품은 부산 티셔츠예요. 10장으로 시작해 손님들의 요구 덕에 1백 장까지 늘어났고 지금까지 생산하고 있죠.”
발란사가 모세의 기적처럼 협업을 척척 해내며 전진한 것은 김지훈의 실행력 덕분이었을까. “우리의 제일 좋은 장점은 유동성이에요. ‘내일부터 치약을 팔아볼까?’ 하면 팔아보는 거예요. 떡볶이를 선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때그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물건을 즉시 가게에 들여놔요. 어떤 것이든 흡수할 수 있어요.”
이어진 그의 말을 들으니 발란사는 쉽게 정의하기 어려운 브랜드라는 생각이 들었다. 홍수처럼 불어나는 정보, 하루아침에 바뀌는 이슈, 손가락을 슝 휘두르면 바뀌는 영상. 모든 게 빠르게 흘러가는 지금이 유동적인 발란사에게 최적인 시대이자 환경이 아닐까. 하지만 그는 오히려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저는 트렌드를 논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더구나 요즘 트렌드의 척도는 예측할 수 없을 만큼 흐려졌어요. 그게 나빠 보이진 않아요. 그저 자신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걸 따르려 하진 않아요. 쉽게 변하는 건 좋아하지 않거든요. 20년 전에 갔던 도쿄 타워 레코드는 지금 가도 여전히 그 자리에 버티고 있어요. 하지만 ‘야, 남포동 부산 극장 앞에서 만나’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6개월이 지나면 사라져 없거든요. 물성의 것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CD나 책을 요즘 사람들은 잘 안 만지죠. 인스타그램 피드 조각을 넘기는 것에만 몰두해요.”
김지훈의 다음 챕터는 발란사를 디자인 스튜디오로 성장시키는 것이다. 좋아하는 것만 쫓아왔듯이 트렌드는 익히 알지 않고 나아갈 것이다.
CIC
김왕일 대표는 대학 졸업 후 미국 플로리다의 브레이커스 팜비치 호텔에서 일했다. 하지만 호텔의 레스토랑 관리직을 그만두고 귀국하기로 결심하고 식음료 산업을 시작으로 음료와 의류, 굿즈를 파는 노점상 노닷프라이즈를 만들었다.
시작은 대학 시절 미리 기획해놓은 음식 산업 프로젝트들을 펼쳐내기 위함이었다. 올인원 아메리칸 스팀펑크 카페 및 레스토랑 더티 트렁크, 아메리칸 차이니스 스트리트 푸드를 내어주는 통통, 편의점 기능을 하는 노닷프라이즈, 인스타그래머블한 매장 겟댓샷까지.
“CICfnb의 이름을 달고 시작했어요.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게 많아 요식업 분야에만 그치기 싫었어요. 그래서 ‘fnb’를 빼고 CIC로 회사명을 바꿨어요. 범위를 넓히고 싶었고 그 결과 노닷프라이즈와 겟댓샷을 열었어요.”
대표 김왕일이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노점상을 의미하는 노닷프라이즈는 일주일 만에 기획해서 만들어진 프로젝트라고 한다. 급변하는 트렌드에 발맞추기 위한 것일까.
“트렌드는 따라가거나 파악하는 게 아니라 제시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식음료 가게, 편의점, SNS를 위한 공간 등 다양한 공간들을 직접 편집하고 꾸려나가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트렌드가 될 만한 것들을 제시하기 위함이에요. 트렌드의 변화에 상관없이 우리가 하고 싶은 걸 계속 보여주는 거죠.”
다채로운 공간 편집의 출발점은 어디일까. “일상이에요. 음악 듣다 콘셉트가 떠오르기도 하고, 영화나 특정 색상을 보고 떠오르기도 해요. 그만큼 위험도도 높아요. 실행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모르니까요.”
김왕일은 지금 트렌드를 명확히 정의 내릴 순 없지만 과도기인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요식업 시장은 뉴트로와 레트로의 경계선에 놓인 것 같아요. 이도 저도 아닌 콘셉트가 만연하잖아요. 그래서 뉴 클래식이라 부르고 싶어요. 클래식한 것에 모던하고 새로운 걸 한 스푼 얹은 걸 의미해요. 요식업이 아닌 다른 시장에서 트렌드는 불확실하지만 개성이 존중된 것이 아닐까요. 각자의 개성이 존중되었으니 불확실하죠. 짧은 영상들만 보아도 다들 자기만의 주제를 갖고 선보이죠. 개성을 드러내는 게 트렌드가 될 수 있겠네요.”
김왕일의 철학은 본능적인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저 하고 싶은 걸 행하는 욕구만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실패에 대한 걱정 때문에 주저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레나옴므플러스>의 모든 기사의 사진과 텍스트는 상업적인 용도로 일부 혹은 전체를 무단 전재할 수 없습니다. 링크를 걸거나 SNS 퍼가기 버튼으로 공유해주세요.
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