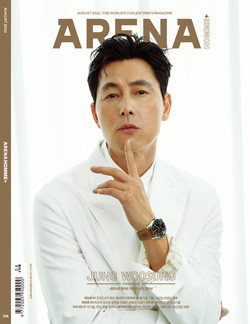영화 <비상선언>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항공 테러를 다룬 스릴러로 송강호, 전도연, 김남길, 임시완 등 훌륭한 배우들이 출연하죠. 이 영화는 어떻게 시작했나요?
제가 10년 전에 받은 한 시나리오에서 출발했습니다. 제가 비행기 공포증이 있어서 오히려 매력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하지만 이야기의 뒷부분이 풀리지 않았고, 몇 번 엎어졌어요. 지난 10년 동안 우리 사회에 여러 재난과 불행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며 느낀 바가 있어 뒷부분을 완성해냈고 이 영화를 어떻게든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착수해 이제야 선보이게 됐네요.
실제 발생했던 비극적인 재난에서 어떤 점을 느낀 건가요?
최근 미국에서는 며칠에 한 번씩 총기 사건이 벌어지고, 전쟁도 터지고, 코로나19라는 재난도 찾아왔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재난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이야기해보고 싶었어요. 우리는 겁 많고 나약하지만 그걸 이겨낼 의지와 용기도 있는 인간이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벌어진 재난을 돌아볼 수 있는 영화가 되길 원했습니다.
로맨틱 코미디 <연애의 목적>으로 시작해서 누아르 <우아한 세계>, 사극 <관상>, 정치 스릴러 <더 킹>까지 많은 장르 영화를 만들어왔는데, 어떻게 이런 넓은 스펙트럼을 소화하나요?
저는 하나를 끝내면 또 다른 걸 하고 싶더라고요. <관상> 끝나고 한창 사극 제안이 많았는데, 그보단 안 해본 걸 하고 싶었어요. ‘내가 재미있는 게 뭐지?’가 저에겐 제일 중요해요. 호기심 생기고, 궁금해지고, 보고 싶은 것. 물론 그만큼 중요한 건 관객도 재미있는 거죠. 우리는 늘 관객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애정 공세를 펼치는 존재니까요.
감독님께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본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매 작품이 그렇습니다. 매 작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노트북 앞에 앉아 신 넘버 1을 쓰는 순간이 출발이죠. 거기서부터 콘티를 짜고, 수많은 스태프들이 현장에서 수많은 테이크를 찍으며 한 컷을 완성하죠. 이 모든 순간이 새로운 길을 개척해나가는 순간이에요.
이번 <비상선언>도 관성적으로 찍지 않으려고 한 부분이 있나요?
늘 관성적으로 찍지 않으려는 노력합니다. 항상 “다르게 가보자, 새롭게 해보자”라고 말하거든요. <비상선언>에선 비행기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부터 낯설고 새로운 과제였습니다. 여기저기 물어보고 찾아가며 할리우드에서 비행기 세트를 공수해왔죠. 그 와중에 코로나19가 닥쳐서 영국에서 오기로 한 기술진들이 못 오게 된 좌절의 시간도 있었어요.
어떻게 밀어붙여서 비행기 신을 완성했나요?
비행기가 360도 도는 장면이 있어요. 그걸 도와주기로 한 영국 기술진들이 오지 못하게 됐을 때, 한국 특수효과팀 데몰리션이 놀이기구 만드는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구현해냈어요. 승객들을 앉힌 상태로 360도 돌리는 건 한국에선 시도한 적 없던 정말 위험한 촬영이었어요. 데몰리션이 수차례 안전성 테스트를 한 후 승객 역할 배우들이 탔고, 이모개 촬영감독과 박종철 촬영감독도 “이건 직접 타서 핸드헬드로 찍지 않으면 절대 느낌이 나지 않겠다”며 같이 탑승했어요. 두 분이 몸을 꽁꽁 묶고 그 무거운 카메라를 들고서 촬영했죠. 그렇게 승객의 표정을 하나도 안 놓치고 박진감 있게 찍으셨죠. 이 신을 없애야 하나 고민할 정도로 어려운 작업이었는데, 다행히 한 명도 안 다치고 좋은 장면을 뽑아내서 뿌듯했습니다. 나중엔 승객들도 놀이기구 타듯 즐겼어요.(웃음)
<더 킹> 때는 정치적인 레퍼런스가 꽤나 적나라했습니다. 그에 대한 주변의 우려는 없었나요?
모 감독이 검찰 무서운 사람들이야, 라고 하더군요.(웃음) 저는 법보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현실,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경고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자료조사를 하면서 실제 권위 있는 정치인이 비합리적인 점을 보고 굿을 하는 것도 재미있다고 느껴져서 넣은 거죠. 용감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몰라서 가능한 거였습니다.(웃음)
창작자로서, 제작자로서 어떨 때가 가장 두려운가요?
매번 두렵죠. 지금도 두렵지만 설렙니다. 결국 영화는 관객에게 보여주기 위해 만드니까, 개봉 전은 매번 굉장히 떨려요. 그럴 땐 배급사를 믿고 홍보사를 믿고 내 것만 잘하면 되겠지 하고 생각합니다.
영화엔 남들보다 앞서 보는 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구안을 가지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입니까?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사회문화 현상을 꼼꼼히 살피지만, 저는 트렌드보다 근본적으로 사람이 가진 욕망이나 호기심을 탐구하는 것이 더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영화는 길게는 2, 3년이 걸리는 긴 프로젝트란 말이죠. 관객에게 보여주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개봉하는 시기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행이나 트렌드를 좇기보단 우리 안의 질문들, 인간의 호기심, 사람들이 과연 어떤 것을 욕망하고 궁금해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집니다.
감독님의 제작사 이름 매그넘 나인은 어떤 뜻인가요?
앙리 브레송, 로버트 카파 등이 소속된 포토 저널리즘 집단 매그넘에서 따왔습니다. 세상을 기록한다는 그들의 정신이 좋았어요. 결정적인 순간을 잡아내는 그들의 사진은 정말 멋지죠.
창작에 영감을 주는 건 어떤 것인가요?
주로 음악과 사진이에요. <비상선언>을 찍을 땐 우드키드의 음악을 많이 들었어요. 그의 음악의 불규칙한 긴장감이 많은 영감을 주었죠. 요한 요한손의 음악도요. 신이 인간을 내려다보는 듯한 압도적인 느낌, 인간에 대한 처연함이 느껴져서 라이선스를 구입해 영화에 사용했고, 현장에서도 그의 음악을 틀어놨습니다.
<더 킹>에서도 음악이 스타일리시하게 사용된다는 인상을 받았는데 음악 애호가셨군요.
정말 좋아하죠. <더 킹>의 인상적인 음악을 꼽으라면 자자의 ‘버스 안에서’, 클론의 ‘난’을 꼽겠습니다. 정말 신나게 찍었어요.(웃음)
감독님에게 모험이란 어떤 건가요?
매일매일이 모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결정을 내리라고 하고, 2천만원, 3천만원씩 청구서가 올라오고, 오늘도 비가 와서 찍기로 계획한 분량을 채우지 못할까봐 내심 전전긍긍하고. 제작까지 겸하는 입장에선 영화를 만드는 하루하루가 엄청난 모험이죠.
달과 우주인에 대한 영화적 상상력을 발휘해 영화를 만든다면 어떤 이야기를 제작하고 싶습니까?
저는 예전부터 우주를 배경으로 한 뮤지컬 영화를 하고 싶었어요. 시나리오도 썼었죠. 우주를 유영하면서 노래하는 영화. 낭만적이면서도 비극적인 이야기인데요, 얼른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독으로서 야심을 듣고 싶습니다.
제 소원은 오래 살아서 많은 작품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영화를 시작할 땐 나이 많은 감독들이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 인터뷰에 참여한 박찬욱 감독님, 김지운 감독님도 왕성하게 최고의 전성기로 활동 중이잖아요. 후배 입장에서는 너무 좋고, 저의 야심 또한 오래 건강하게 살면서 계속 작품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아레나옴므플러스>의 모든 기사의 사진과 텍스트는 상업적인 용도로 일부 혹은 전체를 무단 전재할 수 없습니다. 링크를 걸거나 SNS 퍼가기 버튼으로 공유해주세요.
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