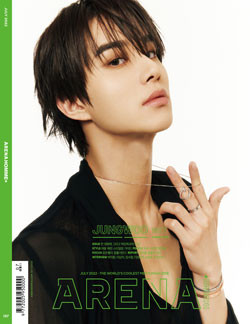지난 4월, 미국이 여권에 남자와 여자가 아닌 제3의 성을 의미하는 젠더 X를 표기하겠다고 발표했다. 모든 사람의 자유와 존엄, 평등을 위한 반가운 변화는 패션계에서도 유의미하게 이뤄지고 있다. 근 몇 년간 젠더리스, 젠더 뉴트럴, 젠더 플루이드 등과 같은 단어가 꾸준히 트렌드의 중심에 등장했고, 이제 여성복과 남성복을 구분 짓는 일은 촌스럽고 고리타분하게 여겨진다. 성의 경계를 허물고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식으로 옷에 대한 규칙도 새롭게 정립되는 중이다. 그렇지만 몸을 드러내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다. 그게 남성일 때는 더더욱 말이다.
이제까지 남자의 섹시함을 대표하는 것은 강직한 수트, 터프하고 날렵한 가죽 소재 등 남성성을 강조하는 시선이었다. 때에 따라 몸이 훤히 드러나는 민소매, 배꼽까지 단추를 풀어헤친 셔츠와 같이 우리 눈에 익숙한 것들을 약간 비트는 형태는 쉽게 볼 수 있었지만 최근의 현상은 엄밀히 다르다. 여성 컬렉션에선 뻔하고 흔하지만, 남성복에서는 생경한 크롭트 톱, 오프숄더, 마이크로 쇼츠와 스커트 등의 디자인이 대거 등장했으니 말이다. 터프한 실루엣과 거친 소재에 의존하던 섹스 어필의 레이더가 남성의 몸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경향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 수많은 브랜드들이 대담하고 절묘한 컷아웃, 거의 투명에 가까운 메시 혹은 오간자 소재로 보디라인을 그대로 드러냈고 남자의 새로운 관능미를 뽐내기 시작했다. 물론, 이러한 움직임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의 글램록 스타로 손꼽히는 데이비드 보위, 믹 재거는 무대뿐 아니라 무대 밖에서도 과감한 노출을 즐겼고, 변방의 패션 브랜드에선 종종 호색적인 디자인을 선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하위문화의 일부로 구분되거나 퀴어 패션으로 치부되던 스타일이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점잖던 하우스 패션 브랜드의 변화 때문이다. 가장 의외의 브랜드는 바로 펜디. 재킷과 셔츠, 타이 모두를 가슴 아래에서 댕강 잘라낸 크롭트 수트는 파격적이었지만 노출에 익숙하지 않은 남자도 시도해볼 법한 클래식한 스타일이었다. 그 뒤를 이은 프라다는 짧디짧은 쇼츠에 천 하나를 덧댄 스코트(쇼츠와 스커트를 혼합해 만든 신조어)로 남자의 길고 매끈한 다리를 과감하게 드러냈다. 또한 배의 한가운데를 동그랗게 잘라낸 쿠레주, 불규칙적인 커팅으로 전위적인 느낌을 완성한 릭 오웬스 등 노골적이고 아슬아슬한 컷아웃 디자인을 채택한 브랜드들도 눈에 띄었다. 뭐니 뭐니 해도 이 분야의 최강자는 신예 디자이너 루도빅 드 생 세르넹. 얇은 끈에 의존한 브라톱, 홀터넥 등 농염하게 몸을 드러내는 디자인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한 그의 컬렉션은 관능을 너머 나르시시즘에 가까운 것처럼 보였다. 대중에게 친숙한 팝스타들 또한 이에 힘을 보탰다. 가위로 거침없이 난도질한 듯한 컷아웃 수트를 입고 나타난 릴 나스 엑스, 가느다란 몸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트로이 시반의 슬릿 드레스는 성별을 대하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명쾌하게 날려버린다.
여성이 성적 대상화에서 벗어나기 위해 편안하고 넉넉한 실루엣을 즐기며 자유와 해방을 추구했다면, 지금의 남자는 여성적이라고 여겨졌던 노출 방식을 받아들여 새로운 남성성을 재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를 수용하기에 가장 중요한 지점은 옷은 여자와 남자를 구분하는 수단이 아니라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일 뿐이라는 거다. 여자다움, 남자다움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나다움을 추구할 때 비로소 진정한 해방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아레나옴므플러스>의 모든 기사의 사진과 텍스트는 상업적인 용도로 일부 혹은 전체를 무단 전재할 수 없습니다. 링크를 걸거나 SNS 퍼가기 버튼으로 공유해주세요.
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