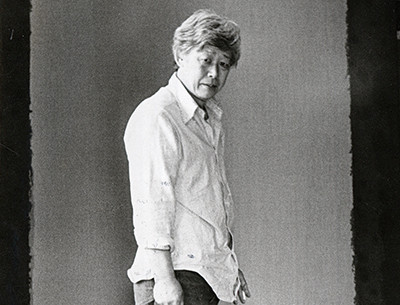먹빛 절벽이 우뚝우뚝 서 있다. 먹빛의 정체는 ‘엄버-블루(Umber-Blue)’. 청다색이다. 암갈색과 청색이 은은히 비치는 먹색. 수많은 색을 사용하던 윤형근은 1973년부터 청다색이라는 검정을 만들고 이것으로 화면을 채우는 그림에 몰두했다. 윤형근은 암갈색(Umber)을 땅의 색, 청색(Blue)를 하늘의 색이라 했다. 그에게 엄버-블루는 하늘과 땅을 아울러 표현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색이었다. 윤형근의 화폭에서 먹빛 절벽은 먼 데서 비추어오는 빛과 같은 빛깔의 여백과 대조된다. 배경 색은 젯소를 칠하지 않은 캔버스 본연의 색이다. 윤형근에게 이는 그 자체로 완벽한 색이었다. 면포나 마포 그대로의 표면 위에 윤형근은 오묘하고 깊은 청다색 물감을 큰 붓으로 푹 찍어 내려 긋는다. 때로는 거대한 캔버스를 바닥에 뉘여 온몸을 써서 채색한다. 물감은 천연 마포의 질감에 침투하면서 스미고 배어나온다. 그 움직임이 만드는 번짐 효과는 수묵화의 그것처럼 오묘하다.
윤형근에게 청다색은 그 밖의 모든 색을 빼앗기고 잃어, 유일하게 남은 하나의 색이다. ‘단색화’를 그리기 위해 여러 색 중 하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윤형근이 청다색에 천착하여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한 1973년은, 그가 극도의 분노와 울분을 경험한 해였다. 숙명여고 미술 교사로 재직 중이던 45세의 윤형근은 중앙정보부장의 지원으로 부정 입학한 학생의 비리를 따져 물었다가 ‘반공법 위반’으로 잡혀가 고초를 겪었다. 그의 고난은 이때가 처음이 아니다. 윤형근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 참혹한 시절을 살아낸 청년이었다.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뒤 미군정이 주도한 ‘국립대학교설립안’ 반대 시위에 참가했다가 구류 조치 후 제적당하기도 했고,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에는 학창 시절 시위 전력으로 보도연맹에 끌려가 학살당할 뻔한 고비를 간신히 넘겼다. 전쟁 중 피란 가지 않고 서울에서 부역했다는 명목으로 6개월간 복역한 바도 있다. 3번의 복역과 1번의 죽을 고비를 넘긴 그는 1973년 이후, 자신에게 남은 단 한 가지 색으로 무심하고 무한한 검정의 시를 쓰기 시작했다. 외마디 소리에 가까운, 침묵의 청다색으로. 윤형근은 생전에도 말이 없는 작가였다. 또한 진리에 사는 사람이었다. ‘진리에 생명을 거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길이라 여겼다.
지금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윤형근 회고전이 열리고 있다. 9년 전부터 준비해온 전시다. 어떤 수식도 없이 2007년에 작고한 작가의 이름 세 글자가 그대로 전시명이다. 작가 사후에 유족이 보관해온 미공개작을 포함한 작품 40여 점, 드로잉 40여 점, 아카이브 1백여 점을 선보인다. 슬픔과 고통을 삭이며 창조한 먹빛의 아름다움이, 윤형근이 자신의 흔적과 분신으로서 그린 장면들이 묵묵히 전시되어 있다. 특히 1980년 6월 제작된 작품 ‘다색’은 단 한 번도 일반에 소개되지 않았다가 이번 전시에 최초 공개된다.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솟구치는 울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려낸 작품이다.

<윤형근> 전
사후 11년이 지난 시점에 새롭게 공개하는 작가의 자료와 작품을 토대로 그의 작품 세계와 생애에 다가간다. 초기 드로잉을 비롯해 윤형근의 생각이 고스란히 담긴 일기 및 노트가 공개되며, 작가의 아틀리에에 소장된 관련 작가들(김환기, 최종태, 도널드 저드)의 작품들과 목가구, 도자기, 토기, 서예 등도 그대로 옮겼다.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3·4·8 전시실
전시 기간 2018년 8월 4일 ~ 12월 16일
<아레나옴므플러스>의 모든 기사의 사진과 텍스트는 상업적인 용도로 일부 혹은 전체를 무단 전재할 수 없습니다. 링크를 걸거나 SNS 퍼가기 버튼으로 공유해주세요.
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