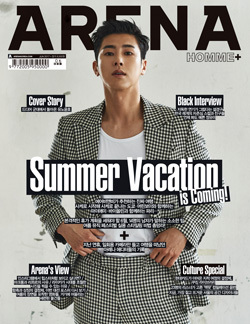Drink 1 발렌타인 파이니스트 200mL
백팩에 발렌타인 파이니스트 200mL를 챙긴다. 주머니에 초콜릿 바도 하나 찔러 넣고 집을 나선다. 분명 저녁이면, 아니 해가 채 지기도 전에 뻣뻣해진 몸을 녹여줄 위스키 한잔이 생각날 테니까. 발렌타인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위스키 중 하나다. 발렌타인의 ‘표준’이라 불리는 파이니스트는 스코틀랜드 전 지역에서 직접 공수한 40여 가지 최상급 원액을 고유한 방법으로 블렌딩해 재탄생된다. 전통 있는 위스키 명가가 그러하듯 정성을 쏟아 만들지만, 이 술을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에 앉아서만 마셔야 하는 건 아니다. 멋들어진 크리스털 온더록스 잔을 찾을 필요도 없다. 힙 플라스크처럼 생긴 작은 보틀을 금주법 시대의 마피아처럼 한 손으로 가볍게 잡고 홀짝홀짝 마시면 된다. 스파이시한 풍미가 혀끝부터 목구멍 깊숙이까지 알싸하게 훑는다. 섬세하고 달콤한 향이 심장을 간질인다.
Drink 2 칸티 프로세코 D.O.C. 200mL
각자 마실 술과 음식을 들고 친구 집의 마당에서 작은 미식회를 열기로 한 날, 이것저것 어수선하게 담은 피크닉 도시락과 함께 칸티 프로세코를 들었다. 가뿐하게 마실 수 있는 200mL 소형으로. 와인잔에 따라 마시면 딱 2잔이 나오는 용량이다. 초여름 피크닉을 위한 술을 하나만 골라야 할 때면 언제나 프로세코부터 챙긴다. 입안에서 보글보글 부서지는 탄산 덕에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도 한없이 경쾌하게 마실 수 있고, 적당한 산도에 감칠맛이 좋아 샐러드에도 샌드위치에도 착착 어울린다. 프로세코는 야외에서 더욱 날개를 편다. 프로세코는 이제 이탈리아 베네토 지역의 글레라로만 만들어야 붙일 수 있는 이름이다. 칸티 프로세코 D.O.C. 역시 베네토 지역에서 글레라 100%로 빚는다. 진한 시트러스 향과 사과 향이 기분 좋게 올라온다. 차갑게 해 빨대를 꽂아 마시기에도 좋다.
Drink 3 미니 모엣 임페리얼 200mL
샴페인을 싫어한다고 말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샴페인은 늘 편견 속에 있는 술이다. 무릇 날렵한 플루트 잔에 마셔야 하며, 냉장고에서 방금 꺼낸 듯 차가워야 하고, 파티와 축하 자리처럼 특별한 날에 곁들여야 한다는 식의 거추장스러운 룰이 샴페인을 따라 다닌다. 미니 모엣은 이런 편견을 시원하게 부순다. 맥주처럼 한 손에 몇 병씩 가뿐히 쥘 수 있고, 가벼운 천 가방에도 쑥 들어가고, 어디에서든 잔 없이 바로 열어 마실 수 있다. 샴페인을 마실 때 필요한 건 격식보다 흥취다. 샴페인은 그런 술이다. 몸과 마음을 느슨하게 풀어놓고 싶은 오후, 철없는 낙관론자이고 싶은 순간에 생각난다. 그런 날 마시는 첫술이 샴페인이라면, 그다음은 더 생각할 필요도 없을 테니까. 랩톱과 함께 미니 모엣 네 병을 가방에 넣었다. 그렇게 담고도 가뿐하기만 했다.
Drink 4 하이네켄 슬림캔 250mL
기온이 발갛게 오르는 계절에 ‘맥덕’들은 생각한다. ‘지구상에, 이렇게 뜨거운 날, 맥주 마시면 안 될 때와 장소가 있나?’ 이들에게 목이 바짝바짝 마르는 한낮의 사무실에서 하이네켄을 떠올리는 일은 자연스럽다. 안주 없이 훌훌 마셔야 맛있으니까. 단맛이나 과실 향이 입에 남지 않고 개운하게 넘어가니까. 상쾌한 맛으론 하이네켄을 따라올 맥주가 없으니까. 질리는 법이 없으니까. 갖은 취향에 호소하는 이런저런 맥주보다 하이네켄이 먼저 생각난다. 첫입에는 옅게 배어나는 구수한 곡물 향이, 뒤이어선 쌉싸름한 맛이 우르르 밀려오는. 여름에 훌쩍 가까워진 오후, 하이네켄 슬림캔을 들고 한강에 간다. 짭조름한 감자칩도 본 체 만 체하며 하이네켄만 마신다. 목구멍을 활짝 열어 꿀꺽꿀꺽 단숨에 삼켜버린다. 콜라 캔처럼 한 손에 기분 좋게 쥘 수 있는 슬림캔에는 딱 250mL의 맥주가 들었다.
<아레나옴므플러스>의 모든 기사의 사진과 텍스트는 상업적인 용도로 일부 혹은 전체를 무단 전재할 수 없습니다. 링크를 걸거나 SNS 퍼가기 버튼으로 공유해주세요.
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