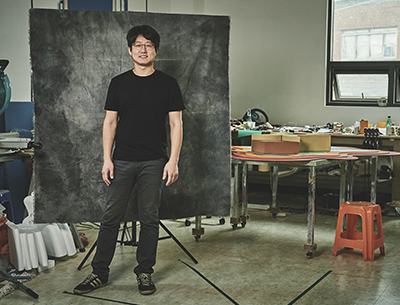가구 디자이너 박길종 서양화를 전공했다. 졸업 후에 아르바이트를 몇 개 했는데 그중 한 곳이 목공소였다. 거기서 2년 정도 일한 경험이 지금 길종상가에서 ‘가공소’를 하며 가구와 물건을 만들게 된 바탕이다. 박길종이 홀로 시작한 작은 프로젝트 ‘길종상가’는 이제 브랜드의 시즌별 쇼윈도 장식, 전시 공간을 위한 집기, 개인에게 필요한 물건, 가구를 비롯한 여러 가지를 만들며 하나의 브랜드가 되어가는 중이다.

가구 디자이너 박길종
서양화를 전공했다. 졸업 후에 아르바이트를 몇 개 했는데 그중 한 곳이 목공소였다. 거기서 2년 정도 일한 경험이 지금 길종상가에서 ‘가공소’를 하며 가구와 물건을 만들게 된 바탕이다. 박길종이 홀로 시작한 작은 프로젝트 ‘길종상가’는 이제 브랜드의 시즌별 쇼윈도 장식, 전시 공간을 위한 집기, 개인에게 필요한 물건, 가구를 비롯한 여러 가지를 만들며 하나의 브랜드가 되어가는 중이다.
어쩌다 보니 길종상가
길종상가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물으면 이제는 “어쩌다 보니”라는 대답이 먼저 나온다. 2010년 12월 24일 밤, 집에 혼자 있던 나는 홈페이지를 하나 마련했다. 그때 홈페이지에 붙인 이름이 길종상가다. 장난 반, 진담 반으로 시작한 프로젝트는 점차 진지하게 바뀌었고, 생각이 확실한 것들부터 실행에 옮기다 보니 호응이 좋았다. 한때 ‘한다 목공소’라는 이름을 붙여 목공소를 운영했고 ‘간다 인력소’를 열어 무엇이든 도와주는 인력사무소 개념을 실현하기도 했다.
물론 한다 목공소와 간다 인력소의 직원은 나 혼자였다. 지금은 물건과 가구를 만드는 ‘가공소’를 지키는 박길종, 식물과 조명을 담당하는 ‘다있다’의 김윤하, 소리 및 시각 작업을 하는 ‘영이네’의 송대영이 길종상가 구성원이다. 길종상가의 형태는 항상 바뀌어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다만 우리가 재미있고 보기에 좋고 예쁜 것들을 만들어내자는 것이 상가의 변치 않는 정신이다. 서울 시내의 낙원상가, 세운상가는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방문하지는 않더라도 늘 그 자리에 있고 앞으로도 있을 존재다. 형태는 바뀔지언정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추억 속 가게 같은 것이 되어도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름을 길종상가라 지었다.
가구 만드는 박길종
처음 길종상가 홈페이지를 오픈했을 때, 홈페이지 안에 폴더를 여러 개 만들었다. 길종상가에 입주한 사람은 나뿐이었지만 인력소, 목공소, 사진관 같은 폴더를 만들어 열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해보자는 마음이었다. 지금은 가구 만드는 일로 조금 더 각광받게 되어서, 가구와 물건을 만드는 상점 일에 집중하고 있다. 이름은 ‘가공소’라 지었고 가공소의 주인이라 하여 나는 박가공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린다. 길종상가를 열고 목공소와 가공소를 해오면서, 언제나 조금 더 새로운 형태나 남들이 잘 만들지 않는 것들을 만들려고 했다. 결국은 생활에 쓰일 것들을 만드는 쪽으로 자리 잡은 것 같다. 그림을 그리는 일도 역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일이기는 했지만 평면적인 작업이다. 내가 원하는 물건을 입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좋았다.

작은 실험들
최근 인스타그램에 ‘가공소’라는 이름의 새 계정을 만들었다. 길종상가를 열고 만들기 시작한 가구와 물건들을 2010년 것부터 하나씩 다시 정리하며 업로드하고 있다. 현재 2013년 1월 작업까지 올려두었다. 작업을 정리하다 보니 흐름이 눈에 보이는데 예를 들어 2012년의 작업은 굉장히 알록달록하다는 것이다. 특별히 색을 열심히 쓰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그 무렵 나는 컬러 실험에 푹 빠져 있었던 것 같다.
거슬러 올라가 2010년 작업에서는 형태적인 실험들이 보였고 2013년 들어서면서는 금속과 나무를 혼합해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일에 집중했던 것 같다. 2010년 길종상가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같은 마음으로 같은 방식으로 물건과 가구를 만든다. 하지만 지금껏 완성한 결과물에서 어떠한 연결성이나 흐름이 보인다. 가구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 가구는 이래야 한다는 내면의 룰이 없다. 그때마다 할 수 있는 작은 실험과 시도를 하면서 지금에 이르렀다.
에르메스 쇼윈도
가공소에서 해온 일은 거의 모두 실질적인 기능에 꼭 부합되거나 형태가 명확한 것이다. 그런데 작년 봄부터 새로운 프로젝트를 해오고 있다. 에르메스의 쇼윈도 프로젝트다. 지금은 문을 닫은 미술관 플라토에서 2014년 7월 전시한 <스펙트럼 스펙트럼> 전을 본 에르메스 담당자가 에르메스 쇼윈도 프로젝트를 제안해왔다. 쇼윈도에도 주제가 있지만 가공소에서 하던 일과는 표현 영역이 다르기에, 훨씬 더 창의적인 요소를 넣을 수 있는 구석이 많다. 입체의 회화를 만들어내는 듯한 느낌도 있다. 에르메스에서 주제를 제시하면 그에 맞게 시안을 만들고 상의한 뒤에 작업에 들어간다. 길종상가 안에서도 전에 없이 새로운 일이다. 작업 중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감흥으로 환기되는 부분들이 많다.
혼재된 것의 예쁨
특별한 디자인 제품을 소유하고 싶다거나 예뻐서 좋아하는 일이 좀체 없다. 예뻐 보인다는 마음은 사실 주관적인 것이니까. 하지만 시대가 만든 예쁜 물건은 있는 것 같다. 1980년대에 쓰던 선풍기, 1990년대에 쓰던 전화기처럼 말이다. 이런 물건이 요즘 물건과 함께 놓여 조화롭게 노는 장면을 아름답다고 느낀다. 이건 배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말이다. 누군가 내 집에 오면 왜 이렇게 잡동사니가 많은지 물을 때도 있다.
그런데 내 눈에는 여러 가지가 조화롭게 섞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안에서도 특별히 더 예쁜 부분을 찾아낼 때 쾌감을 느낄 때도 있고, 이런 것이 길종상가 멤버와 나누는 이야기 소재가 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겠지만 서울도 옛것과 지금의 것이 혼재된 도시다. 누군가는 못났다고 하는 이 혼재된 장면들을 보는 일도 좋아한다. 혼재된 것들이 자아내는 아름다움이 좋다. 예쁜 유리창과 조악한 간판이 섞여 있는 장면에서도 나름 조화를 발견할 때가 있다. 우연히 발견한 어떤 배열과 배치에서 얻는 쾌감이 크다.
당신의 이야기
초반에는 재료가 주는 영감이 컸다. 지금은 의뢰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지금의 영감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야기다. 누구나 길종상가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어쩌면 이곳을 찾는 모두의 이야기가 영감으로 작용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에게 어떤 기능, 어떤 물건이 필요한가를 생각하는 것이 결국 좋은 물건을 만들기 위한 선결 조건이다. 나는 그들에게 여러 가지 제안을 한다.
그것은 디자인적인 요소일 수도, 기술적인 요소일 수도 있다. 이야기를 듣고 떠오른 것들을 적절하게, 아름답게 조합해 뭐든지 해보는 편이다. 일에 따라서 재료나 경향은 달라지지만 계속해서 실험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내가 제안한 것을 의뢰인이 받아들이는가, 아닌가에 따라 물건은 다른 모습이 되겠지만 말이다. 그래도 길종상가를 찾아, 가공소를 들러 뭔가를 의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의 제안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준다.
<아레나옴므플러스>의 모든 기사의 사진과 텍스트는 상업적인 용도로 일부 혹은 전체를 무단 전재할 수 없습니다. 링크를 걸거나 SNS 퍼가기 버튼으로 공유해주세요.
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