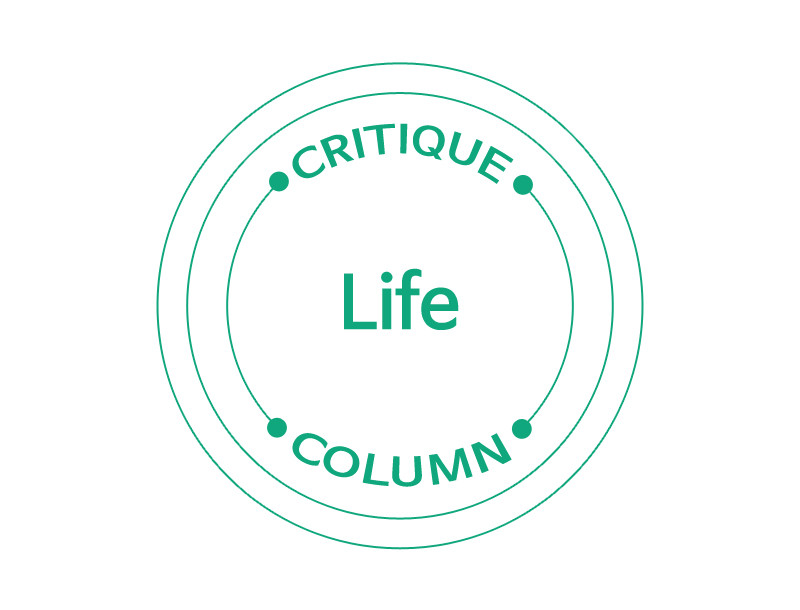서울을 떠나는 상상을 했다.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될까. 북쪽? 동쪽? 어디든 서울을 벗어난다면 마당이 있는 집에서 살고 싶다. 박공지붕 이층집. 뒷마당에는 너른 잔디가 있고. 잔디에는 작은 플라스틱 미끄럼틀이, 또 아이 장난감들이 놓여 있다. 마당 한켠 텃밭에선 봄에 심은 토마토가 담장을 타고 내 키만큼 자랐다. 나무로 만든 테라스에는 캠핑 체어와 작은 테이블이 있고, 바비큐 화로에는 지난밤 태운 숯이 하얗게 남아 있다. 겨울이 오면 꼬마전구와 크리스마스 장식을 한 이웃집들을 지나며 아들에게 무슨 선물을 사줘야 할지 고민하는 삶. 평지 위에 바둑판처럼 선을 그어 네모반듯한 땅에 예쁘게 지어진 주택들이 자리한 동네. 타운하우스 광고에 나오는 삶을 꿈꿨다. 상상만 해도 달콤했다.
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했다. 두 달 뒤면 걸어다닐 것 같다. 행복하다. 기적 같고. 내년에는 층간소음이 걱정될 것 같다. 아이는 행복하면 뛰고, 즐거우면 달린다. 아이는 뛰어야 하는데, 아이가 뛰면 미안할 거다. 아이에게도 이웃에게도 자신에게도. 층간소음이 걱정되면 매트 깔면 되고, 슬리퍼 신으면 되는 일이겠지만, 때마침 내년에 전세 계약이 만료된다. 지난 계약 때는 버텼지만, 다음 계약 때는 전세자금 마련이 어려울 것 같다. 희망이라면 월마다 바뀌는 부동산 정책이다. 다음 달에는 어떤 정책이 나올지 모른다. 규제 일변이었으니 다음 달에도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
삼성전자 주식이 10만원 될 거라는 희망처럼, 내년에는 규제가 풀릴 거라는 기대를 가질 수도 있다. 뭐가 맞을지 아무도 모른다. 내년 전세 계약 시기에는 대출 규제가 풀린다면? 엥, 그건 어디까지나 바람이고. 대출을 받는다 해도, 이미 대출이 있기에 추가 대출금을 감당하기 어렵다. 일이억 정도라면 버텨보겠지만, 그건 정말 버티는 거다. 제대로 된 삶이 아니다. 나는 죽지 않으려 살아온 게 아니다.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보면 서울을 떠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든다. 서울을 떠나는 사람이 늘고 있다. 2017년부터 2020년 4년 동안 서울 인구 44만4천6백57명이 경기도로 이주했다고 한다. 서울 변두리로 밀려난 사람들이 서울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이동한 것이다. 서울이 보이지 않는 곳에 살게 된 그들은 매일 아침 서울에 오고, 밤이 되면 다시 서울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달려간다. 4년 전에도 서울 아파트는 비쌌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지금 부동산 시장이 급등했으니, 집 살 때가 아니라고 만류했다. 한동안 서울 집값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고, 그 편차는 미미했다. 조금이라도 싼 값에 사는 게 맞으니, 시장이 잠잠해지길 기다렸다. 그게 패착이었다. 당시 무리한 상태였지만, 부모님에게라도 손을 벌려 집을 샀어야 했다. 버스는 떠났다. 그때 손 벌리지 않아 죄책감은 없지만, 앞날이 걱정이다. 근로소득의 시대가 끝났고, 금융소득의 시대라고 한다. 나는 둘 다 자신이 없다.
주말에는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신도시에 간다. 지난주에는 김포에 다녀왔고, 그 전에는 파주와 고양에 갔다.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집값은 싼데, 우선 서울 인근부터 살펴보기로 했다. 우리는 기왕 탈서울 할 거라면, 아파트보다는 주택에 살기로 했다. 전원주택. 한남동이나 성북동의 삶을 재현할 수는 없겠지만 아파트에서의 삶과는 다르리라는 기대다. 무엇보다 층간소음 걱정은 없을 거다. 파주의 전원마을은 규모가 컸다. 차고가 달린 이층집에 마당도 으리으리했다. 토지는 어림잡아 1백 평은 되어 보였다. 블록을 따라 가지런히 정리된 집들. 멀지 않은 곳에 어린이집이 있고, 학교도 있다. 서울 가는 대중교통은 불편하지만 차를 타고 다니면 그럭저럭 견딜 수 있을 거다. 문제는 가격이다.
강남 아파트 값이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과 더 가까운 곳으로 올라갔다. 마을은 한산하고, 빈 부지가 많은 전원마을이었다. 마을은 예쁘지만 집은 리모델링이 필수고, 가능하다면 다시 지어야 했다. 그래도 마당이 있다는 점, 비교적 평지라는 점이 끌렸다. 무리하면 살 수 있는 금액이었다. 수리비까지 계산하면 힘들겠지만…. 단점은 서울 접근성이다. 서울까지 한 번에 가는 광역버스를 타기는 어렵다. 서울에 간다고 해도, 다시 서울에서 지하철이든 버스든 갈아타고 이동해야 한다.
서울 가기 참 어렵다. 자차로 이동해도 빠르면 한 시간이다. 초등학교는 하나 있지만, 병원이나 마트 같은 시설은 없다. 심지어 편의점도 멀다. 김포 전원마을은 비교적 최근에 만든 곳이라 깨끗했다. 집들은 규모는 작지만 가지런했다. 근데 정말 작았다. 연면적이 40평이라는데 층별 공간은 15평 남짓했다. 1층에 작은 거실과 주방, 2층에 작은 방 세 개, 3층은 다락과 테라스. 좁은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었지만 좁은 집을 그 돈 주고 사야 한다는 게 납득이 안 됐다. 마을은 예쁘고, 1층 테라스에서 고기 굽는 사람들은 행복해 보였다. 허나 비쌌다. 서울과 가까우니 비싼 게 이해는 된다. 하지만 그 돈이면 탈서울 할 이유가 없다. 우리가 정말 주택에 사는 게 맞을까? 눈을 낮춰 매매 가능한 타운하우스를 찾아갔다.
내비게이션은 목적지가 가깝다고 하는데, 우리는 공단을 지나고 있었다. 왜 집이 이런 데 있어? 나는 내비게이션한테 물었고, 아내는 주소가 틀린 거 아니냐고 했다. 덤프트럭들이 지나다니는 도로 샛길을 인부들이 걸어가고 있었다. 창고형 공장단지를 지나자 좁은 산길이 나타났다. 가파른 언덕을 올라 으스스한 숲길을 지나 창고형 공장을 또 지나자 타운하우스 이름이 적힌 이정표가 나왔다. 눈 내리면 못 오를 언덕을 올라가니 공사 중인 타운하우스 단지가 보였다. 언덕에 4층짜리 하우스들이 레고처럼 이어졌다. 모델하우스에 들어가자 1층의 벙커형 주차장을 보여주고는 2층으로 올라 집을 안내했다. 역시 좁은 공간을 잘게 나눠 방을 만들고, 계단으로 층을 쌓아 힘들게 오르내려야 하는 집이었다. 옥상 테라스에 오르니 전망은 좋았다. 전망이 좋을 수밖에 없다. 산꼭대기에 있고, 주변에는 공장과 논두렁밖에 없으니 해 지면 밤바다 보는 것과 뭐가 다르겠나. 치킨 배달도 안 될 것 같았다. 이런 곳을 도서 산간지역이라고 하나? 여튼 겨울 비탈길은 부지런히 제설 작업하면 된다지만, 중장비가 오가는 인도도 없는 큰길은 아내와 아이가 다니기 위험했다. 신도시에는 타운하우스들이 늘고 있다. 전원의 꿈을 가진 서울 사람들을 기다리는 빈집들이 경기도 야산에 우후죽순 생기고 있다. 유튜브에서 근사한 타운하우스를 보면 아름다운 전원 생활이 기대된다. 하지만 근사한 타운하우스는 서울 아파트만큼 비싸다. 구입 가능한 가격의 주택은 되팔리지도 않을 것 같다. 투자 가치가 마이너스라는 뜻이다.
직장과 주거는 가까울수록 좋다는데, 경기도 주택에 살면 불편은 감수해야 한다. 새로 개통된 고속도로가 많아 서울 접근성이 좋다지만 운전 못 하는 아내에게는 아무 의미 없다. 경기도 주택과 서울 아파트 전세. 무엇이 더 나은 삶인지 아직 결정 못 했다. 가능하면 서울을 떠나고 싶지 않다. 서울에 살 수 있다면, 더 오래 살고 싶다. 고향이니까. 밤늦게 불러낼 수 있는 친구들은 여기에 있다. 내가 다닌 학교도, 남몰래 울며 걷던 거리도, 막차가 올 때까지 놀던 술집도, 밤새 노트북으로 작업하던 카페도, 하물며 직장도 서울의 중심 용산이다. 내가 가진 것들은 모두 이곳에 있다. 그런데 왜 서울을 떠나야 하나. 탈서울이라고 말하지만 팩트는 퇴출당한 거다. 서울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아무도 사과하지 않을까.
<아레나옴므플러스>의 모든 기사의 사진과 텍스트는 상업적인 용도로 일부 혹은 전체를 무단 전재할 수 없습니다. 링크를 걸거나 SNS 퍼가기 버튼으로 공유해주세요.
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