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연보다 조연이 더 빛나는 영화가 있다. 음식도 마찬가지. 주재료보다 부재료가 먹고 싶어 찾는 음식 19가지.
샤부샤부와 죽
서양인의 식탁에는 언제나 빵이 곁들여지듯, 한국인의 밥상에는 밥이 빠지면 뭔가 허전하다. 샤부샤부를 먹고 나서 그 국물에 칼국수를 말아 먹고 배가 부르지만, 죽을 약간이라도 쑤어 먹어야 된다. 기본 육수에 채소와 고기를 살짝 담가 먹는 샤부샤부는 시간이 지날수록 국물 맛은 진해지고, 칼국수를 넣으면 국물이 진득해진다. 이 진하고 진득한 국물에 밥을 넣고 달걀물을 넣어 살짝 끓이기만 해도 맛 좋은 죽이 완성된다.
삼겹살과 함께
굽는 김치
삼겹살이 노릇노릇 익고 기름이 불판에서 쭉쭉 빠져나간다. 기름이 흘러나가는 자리가 바로 신 김치를 굽는 자리가 된다. 돼지기름에 구운 김치는 어떠한 기름에 구운 것보다 맛있기 때문이다.
닭백숙 속 찹쌀죽
복날에 꼭 먹는 닭백숙. 아버지에게 닭다리를 내어주고, 장남에게 몸통의 살을 쥐어주고, 닭날개마저 언니에게 뺏겨도 억울하지 않았다. 닭고기보다 배 속에 숨겨진 찹쌀죽을 더 좋아했기 때문이다. 마늘 듬뿍 넣고 삶은 닭백숙 속 찹쌀죽은 닭의 누린내가 전혀 없고 육수를 그대로 머금어 소금 간만 하고 떠먹어도 맛있다. 여기에 깍두기나 된장에 찍은 매운 청양고추만 있으면 한 그릇 뚝딱 비운다.
보쌈에는 굴무침
굴이 제철일 때 굴무침이 먹고 싶다면 보쌈집을 향한다. 굴무침 전문점은 없지만 보쌈집의 굴무침은 전문점 못지않은 내공을 지니고 있다. 배추속대의 노란 잎을 떼어다가 야들야들한 수육 한 점과 새우젓, 무채 그리고 굴무침을 올린다. 역시 굴무침의 내음이 감돌아야 보쌈의 완전체를 이루는 듯하다.
감자탕의 통감자
감자탕에 ‘감자’를 넣어 감자탕이라고 불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아는 사실이다. 돼지 등뼈에 든 척수를 감자라고 하는 설과 돼지 등뼈를 부위별로 나눌 때 감자뼈라 부른다는 설이 있는데, 어쨌든 뼈 사이사이에 있는 살코기를 발라먹는 재미는 똑같다. 살을 발라먹고 국물을 떠먹을 때 통감자를 숟가락으로 쪼갠다. 포슬포슬한 감자 속살이 보이면 두툼한 등뼈를 획득한 듯 눈빛이 초롱초롱해진다. 참고로 감자탕의 유래를 말하자면, 1899년 경인선 철도공사 때 많은 인부들이 동원되어 인천으로 몰리면서 생겨난 음식이라는 설이 가장 신빙성 있다. 한창 힘을 써야 하는 인부들이 뼈와 감자, 시래기를 넣어 끓인 탕에 열광하는 것에 착안해 만들어졌다고 전해진다.
안동찜닭의 백미, 넓은 당면
짭조름한 간장 맛과 매콤한 맛이 적절히 배합된 안동찜닭이 경북 지역에만 머물지 않고 전국적인 프랜차이즈로 성공하게 된 것은 ‘넓은 당면’이 한몫한다. 일반 당면이 아닌 넓적한 당면은 그 너비만큼 양념이 잘 배어 있고 졸깃한 맛이 일품이다.
빨간 떡볶이엔 역시 삶은 달걀
국민 간식인 떡볶이. 떡볶이 국물에 튀김, 부추전, 군만두 등을 찍어 먹으면 맛있지 않을 수가 없다. 떡볶이 국물과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을 굳이 꼽자면 삶은 달걀이다. 삶은 달걀의 흰자보다는 퍽퍽한 달걀노른자와 국물을 함께 먹으면 녹진한 맛이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다. 빨간 고추장떡볶이에는 삶은 달걀이지만, 궁중떡볶이에는 씹는 재미가 있는 호박오가리, 즉석떡볶이에는 양배추가 있다.
아귀보다 콩나물
몸과 머리가 납작하고 입이 커서 못생긴 아귀는 원래 재수 없는 생선이었다. 하도 흉하게 생겨서 그물에 걸리면 버리거나 기껏해야 거름으로나 쓸 정도였다. 아귀가 술안주로 극진히 칭송받게 된 것은 마산 오동동에서 장엇국을 팔던 혹부리 할머니의 역할이 컸다. 아귀로 북어찜 만들 듯이 한 번 해본 것뿐인데, 의외로 맛있었던 거다. 맛있게 매운 양념장 속 보들보들한 아귀살이나 쫄깃한 아귀 위도 맛있지만, 아삭거리는 콩나물을 건져 먹는 재미도 쏠쏠하다.
암게찜의 알
살이 오동통 오른 수게보다 암게가 더 기다려지는 이유는 바로 알 때문이다. 졸깃한 살보다 알을 꼭꼭 씹으면 그 고소함이 폭발한다. 물론 내장이 있는 게 껍데기에 밥을 비벼 먹어도 맛있지만 알만 먹어야 그 진미를 느낄 수 있다.
추어탕의 산초가루
맛은 향으로 인지된다. 가끔은 향신료나 향신채의 향이 그리워서 그 음식을 먹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유의 향을 지닌 산초가루와 방아 잎을 듬뿍 넣은 추어탕이 그러하다.
김치찌개의 두툼한 돼지고기
언제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메뉴 중 하나인 김치찌개. 선호도에 따라 김치찌개에 들어가는 주재료는 달라지겠지만, 김치찌개에 듬뿍 들어 있는 두툼한 목살은 육수에 헌신한 고기와 달리 야들야들하고 간이 속 배어 건져 먹는 재미가 쏠쏠하다.
월드콘 속 초콜릿
유명한 TV 드라마 시리즈 ‘응답하라 1988’이 시작했다. 1988년을 배경으로 딸 2명에 막내아들이 있는 집의 가장은 퇴근길에 아들만 불러내 월드콘을 사준다. 담배가 600원 하던 시절 월드콘은 300원으로 아이스크림계의 사치품이었던 거다. 부라보콘, 월드콘 등 콘 아이스크림이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이때, 바닐라아이스크림 위로 초콜릿과 견과류를 올린 것도 한몫했지만, 역시 화룡정점은 아이스크림을 거의 다 먹어야 나오는 초콜릿이었다.
고등어조림 속 커다란 무
두툼하게 썬 무를 냄비 바닥에 깔고 고등어를 얹은 뒤 양념장을 끼얹어가며 자박하게 조린 고등어조림. 양념이 속 밴 무에 고등어보다 먼저 손이 간다. 매콤함 속에 시원한 맛이 있고 감칠맛 그득 나는 무는 감초 같은 역할을 톡톡히 한다.
과메기와 물미역
물미역은 과메기가 한창 나올 때 제철이다. 바다 내음 물씬 풍기는 과메기와 물미역은 맛의 상승효과가 있어 한 입 물면 그 자체가 바다다. 물미역은 초장에만 찍어 먹어도 맛있는데, 특히 돌미역에 갓 지은 밥과 초장을 넣어 쌈밥을 먹으면 밥도둑이 따로 없다.
先닭갈비 先볶음밥
춘천의 명물 닭갈비. 닭갈비 얘기하면 고구마를 떠올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가래떡을 떠올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식사의 마무리를 잘하면 그 음식에 대한 기억도 좋게 남아 있다. 양념이 묻어 있는 널따란 철판에 꼬들꼬들한 밥과 김가루, 참기름 약간 뿌려 볶은 밥과 함께 물김치로 마무리하면 ‘잘 먹었다’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단팥죽 속 새알심
동지에 쑤어 먹는 팥죽. 엄마가 팥죽을 끓인다고 하면 가족 모두 한자리에 모여 동글동글 새알심을 빚었다. 불그죽죽한 팥죽을 먹다 새하얀 새알심이 드러나면, 다함께 먹는 팥빙수인데 어쩌다가 딸려온 하나밖에 없는 인절미를 먹은 듯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다. 만약 올해 팥죽을 쑬 예정이라면 새알심 속에 잣 2~3개 정도 함께 넣어 빚는 것을 권한다. 달달한 팥죽에 쌉쌀한 잣의 맛이 뒤섞여 지금까지 먹었던 팥죽과는 또 다른 맛을 느낄 것이다.
민물매운탕의 수제비
메기, 쏘가리, 민물게, 민물새우 등을 넣고 끓인 얼큰한 민물매운탕. 민물고기는 크기가 들쑥날쑥해 작은 것은 손가락 길이만 하니 통째로 넣고 한창 끓이다 보면 살이 부서지기 마련. 여기에 수제비 반죽을 뚝뚝 떼어 넣으면 걸쭉해지면서 수제비와 생선살을 함께 떠먹는 맛이 일품이다.
충무김밥의 반찬 갑오징어무침과 무김치
맨밥을 손가락 굵기만 하게 말아낸 꼬마김밥에 곁들여 나오는 갑오징어무침과 무김치. 충무를 오가는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 여객선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러 시간이 걸리는 바닷길에 마땅한 요깃거리가 없던 승객들이 김밥을 사서 배에 올라 그것으로 식사를 대신했다고 한다. 속을 채운 김밥은 워낙 잘 쉬어버려 못 먹게 되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여기에서 착안해 밥은 밥대로 싸고, 반찬은 따로 담아주기 시작했던 것. 충무김밥의 반찬으로 졸깃한 갑오징어무침과 아삭한 무김치는 신의 한수였던 것이다.
비빔냉면의 가자미회
함흥 지방의 바닷가에서는 예전부터 가자미가 많이 잡혔다. 신선한 가자미로 회를 떠서 맵게 양념해 먹곤 했는데, 이 회무침을 냉면에 얹은 것이 바로 회냉면이다. 매콤새콤달콤한 양념에 뼈째 썬 가자미회를 무쳐 넣어 오돌오돌 씹히는 맛이 냉면을 먹는 흥을 돋운다.
주연보다 조연이 더 빛나는 영화가 있다. 음식도 마찬가지. 주재료보다 부재료가 먹고 싶어 찾는 음식 19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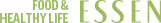










 0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