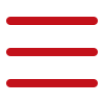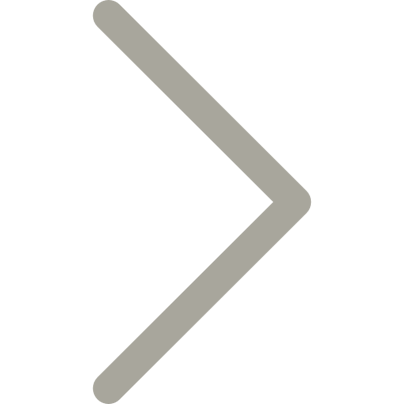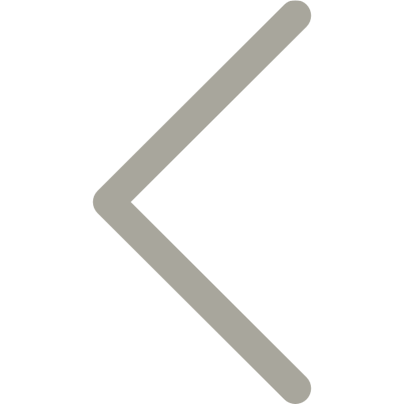여자의 책방
주머니의 송곳 같았던 금원
3월의 작가는 여행기 <호동서락기(湖東西洛記)>를 쓴 조선 시대 작가 김금원이다. 금원이 태어난 해는 1817년. 조선 순조 17년이다. 여성에게 특히 가혹했던 조선 시대였다. 그의 말에 따르면 “남자는 사방에 뜻을 두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여자는 발이 규문 밖을 나가지 못하고 오직 술 빚고 밥 짓는 것만 의논해야”하던 시절이었다. 금원이 그중에서도 더 불행했던 것은, 양반이었으나 그다지 잘살지는 못했던 아버지와 기녀였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다. 게다가 몸도 약했다. 그러나 그 덕분에 좋았던 것은 너그러운 부모가 약한 금원에게 집안일을 시키지 않고 글을 가르치고 경서와 역사서를 익히도록 독려했다는 것이다.
금원이 남장을 하고 여행에 나선 것은 그가 열네 살 때였다. “여자로 태어났으니 깊은 담장 안에서 문을 닫아걸고 법도를 지키는 것이 옳은가. 한미한 집안에서 태어났으니 처지대로 분수에 맞게 살다가 이름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옳은가.” 자문하던 그는 마음을 정하고 부모를 설득해 여행길에 나선다. 그로서도, 그의 부모로서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으리라. 그러나 막상 여행에 나서는 마음은 화창하였다. “가슴이 트이며 마치 매가 새장을 나와 저 푸른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것 같고, 천리마가 재갈을 벗어 던지고 천리를 내닫는 듯한 기분이었다”고 그는 전한다.
20년이 지난 후, 이때의 여행을 기록한 글에 그는 <호동서락기>라는 제목을 붙인다. 충청도 호서 지방에서 따온 호(湖). 금강산과 관동팔경의 동(東), 평양과 의주 등 관서 지방을 뜻하는 서(西), 서울 한양의 락(洛). 이 모든 곳을 여행했다는 의미의 기(記). 제목에 그가 다닌 동선이 다 들어 있다. 제천 의림지, 단양팔경, 금강산, 관동팔경, 설악산, 한양, 개성까지 무려 1,000km에 달하는 경로다. 20년 후에나 기록했다고 하지만 당시의 느낌이 생생하게 살아 있다. 필사로 전해 내려오던 이 책은 금강산 여행을 하려는 이들의 필독서가 되어 많은 인기를 끌었다고 한다.
이후 어머니의 신분에 따라 기생이 된 그는 특출한 글 솜씨로 유명해진다. 원주에 온 선비들이 “산 중에는 금강산을, 사람 중에는 금원을 봤다”고 할 정도로 이름을 떨쳤다. 그러나 17살 연상인 김덕희의 소실로 들어가기 전까지의 삶은 가려져 있다. 당시에 활동하던 ‘금앵’이라는 이름의 시기(詩妓)가 아마도 그가 아닐까 추측할 뿐이다.
남편을 따라 한양으로 이사한 그는 문학적 재능이 뛰어났던 다른 기생들과 함께 별장인 삼호정에서 시 모임 ‘삼호정시사’를 연다. 열네 살에 남장을 하고 여행을 떠났던 것만큼이나, 조선 최초로 여성 시인들의 모임을 연 것도 남다른 기개가 필요했으리라. 삼호정시사는 그들에게는 작은 낙원이었다. 그러나 활동은 오래가지 못했다. 남편의 상황에 좌우됐던 당시 여성들의 처지와, 여성만의 시 동인 모임을 곱게 보지 않았던 분위기, 그리고 주요 멤버인 죽서의 죽음을 겪으며 삼호정시사는 해체된다.
그가 남편인 김덕희의 죽음을 맞이하며 쓴 제문을 읽은 추사 김정희는 이렇게 탄복했다. “지아비를 잃은 이의 슬픔이 초췌하면서도 단아하고 비통하면서도 아름답습니다.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어찌 이리도 뛰어난 글이란 말입니까.” 그 아름다운 글 중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몇 편 없다. 아쉬울 따름이다.
글 박사(북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