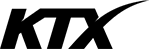“옛 장수 모신 낡은 사당의 돌층계에 주저앉아서 나는 이 저녁 울듯 울듯 한산도 바다에 뱃사공 되어 가며/ 영 낮은 집 담 낮은 집 마당만 높은 집에서 열나흘 달을 업고 손방아만 찧는 내 사람을 생각한다”(백석의 시 ‘통영2’ 중에서). 1930년대에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러 통영에 들어온 백석은 충렬사 계단에 앉아 시를 읊었다. 끝내 이루지 못해 헛헛한 걸음을 돌렸겠으나, 한산도 바다를 떠다니는 사공의 그 마음 지금도 생생하다. 미항이라는 수식이 세월의 더께에 빛바래 고루해졌을지언정 통영은 세월을 건너도 변함없이 아름다워서. 옛 묵객의 숨결을 닮은 시 한 수 뽑아 부두 갯내에 포개고 천개산·벽방산 너머 온 사방에 보내나니, 누구든 느낄 것이다. 섬 많은 남해 풍경이 시처럼 어린 통영의 바다 내음은 이다지 짙다.
통영에서 여행은 시가 된다. 미륵산 정상에 올라 바다에서 돋아난 한려수도 섬들을 내려다보며 달아공원에서는 파도를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낙조를 만난다. 연꽃 같은 연화도 기암괴석을 더듬어 살핀 뒤에 쉬엄쉬엄 소매물도로 가 외떨어진 듯 아스라한 등대섬을 감상해도 좋다. 눈길을 한바탕 바다에 적시고 육지를 디디면 푸른 물결 깊은 여운이 문학과 음악의 길을 밝힌다. 소설가 박경리 생가와 묘소, 기념관은 선생이 집필한 <토지> <김약국의 딸들>의 장면 장면을 눈앞에 펼쳐 보인다. 동서양 기법을 아울러 그만의, 한국만의 음악을 창조한 작곡가 윤이상의 자취는 생가 터, 기념관, 윤이상 거리에서 선율로 흐른다. 무심히 던진 시선에 시가 들어오고, 내리쉬는 숨에 시가 따라 나오는 바다와 삶의 정경이 이르는 데마다 완연하고 또 찬연하다. 통영 출신 유최늘샘 감독은 주민 20명이 사는 우도를 찾아 그들의 삶을 들었다. 그 이야기를 그러모아 2021년 발표한 다큐멘터리 영화 <우도마을 다이어리>에서 섬사람은 말한다. “바닷물이 나며는 구영 구영 이래 살 틈에 보며는 소라, 고동 이런 게 배기 있고. 가을 되모 귀뚜라미가 정적을 무너뜨리제. 우리는 언어 자체가 다 시라.” 그렇게 통영 여행객은 울듯 울듯 한산도 바다에 뱃사공이 되어 간다.
이곳에서 촬영했어요
<KTX매거진>의 모든 기사의 사진과 텍스트는 상업적인 용도로 일부 혹은 전체를 무단 전재할 수 없습니다. 링크를 걸거나 SNS 퍼가기 버튼으로 공유해주세요.
KEYWORD










 MOVIE
MOVIE






 DRAMA
DRAMA



 MUSIC VIDEO
MUSIC V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