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초, 경리단 길에서 새벽 술자리가 있다기에 늦은 시간 옷을 주섬주섬 주워 입고 집을 나섰다. 눈이 한창 내린 뒤라 길은 미끄럽고 날은 추웠다. 잔뜩 옷을 여미고 총총걸음으로 걷다보니 머릿속엔 ‘술자리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어디 따뜻한 나라로 튈까?’라는 생각이 가득 찼다

지난 1월 초, 경리단 길에서 새벽 술자리가 있다기에 늦은 시간 옷을 주섬주섬 주워 입고 집을 나섰다. 눈이 한창 내린 뒤라 길은 미끄럽고 날은 추웠다. 잔뜩 옷을 여미고 총총걸음으로 걷다보니 머릿속엔 ‘술자리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어디 따뜻한 나라로 튈까?’라는 생각이 가득 찼다. 따뜻한 나라를 생각하니 비실비실 웃음이 나오고, 걷다보니 어느덧 경리단 뒷골목 약속 장소에 다다랐다. 약속 장소 간판에는 태국어로 ‘까올리’라고 적혀 있고 바로 그 옆에 영어로 ‘포차나’라고 적혀 있었다. ‘까올리’는 태국어로 한국을 뜻하고 ‘포차나’는 간이식당을 의미하는 단어였다. 태국어로 ‘한국 식당’이라고 위트 있게 적어놓은 셈이다. ‘어라?’ 하는 마음으로 식당의 문을 열었다. 맙소사, 순간 태국의 전경이 그대로 눈앞에 펼쳐졌다. 나는 태국을 유난히 좋아해 일 년에 두세 번씩 방콕행 비행기를 타곤 한다. 따뜻하게 불어오는 끈적한 바람도 좋고, 낙천적이면서도 수줍음을 잘 타는 태국 사람들의 성격도 좋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태국 음식이 좋다. 태국 음식에는 각박한 도시 생활에 메마를 대로 말라버린 심신을 치유해주는 묘한 매력이 있다. 특히 나는 외지인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오래된 골목에 있는 현지 간이식당을 찾는 것을 좋아한다. 한창 여기에 빠져 있을 적에는 아예 숙소를 방콕 시내 외곽에 얻고 현지인들만 이용하는 간이식당을 찾아다닐 정도였다. 태국의 간이식당에는 무어라 설명할 수 없는 태국 서민들의 삶과 애환이 배어난다. 그것은 마치 내가 즐겨 소개하는 ‘서울의 낡고 오래된 작은 식당’에서 느끼는 그것과 비슷하다. 이 ‘느낌’ 속에는 음식의 ‘솔(soul)’이 있고 ‘판타지’가 있다. 한국에는 이러한 ‘솔’과 ‘판타지’를 느낄 수 있는 태국 식당이 전무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전무했다. 까올리 포차나를 만나기 전까지는!)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태국 레스토랑은 사람들이 붐비는 장소에 근사하게 인테리어를 꾸며놓고 한껏 멋을 내고 있다. 미안하지만 이런 식당에서 먹는 태국 음식은 마치 서양인들이 가득한 태국 휴양지 리조트 식당에서 먹는 브런치 정도의 느낌이랄까. 그런데 경리단 뒷골목에서 발견한 이 식당은 다르다.

한껏 멋을 부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탈하다. 하지만 센스는 충분하다. 어느 정도냐 하면 태국의 간이식당 모습을 너무나 똑같이 재현하고 있어 식당의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여기가 태국인가, 한국인가?’라는 생각에 당황스러울 정도다. 입구 쪽에 마련된 작은 키친에서는 쉴 새 없이 팬에 음식을 볶아내고, 그 키친에서 나오는 태국 특유의 향신료 냄새가 가게 전체를 가득 메운다. 키친은 불과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 (태국의 간이식당 키친을 한 번도 못 본 사람들에게 이 식당의 주방은 ‘소꿉놀이’ 정도로 보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가게의 벽에는 태국의 허름한 식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벽걸이 시계와 달력이 무심히 걸려 있다. (나는 이것을 센스로 보고 싶다. 태국 동네 야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소품으로 인테리어를 하는 현지 간이식당의 특징을 잘 살렸다.) 손님들이 앉아 있는 형형색색의 간이 테이블과 의자는 또 어떠한가. 태국의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그것과 똑같다. 사용하는 식기를 내왔을 때 급기야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오 마이 갓!’을 외쳤다. 태국의 간이식당에서 약속이나 한 듯 일괄적으로 사용하는 촌스러운 컬러의 플라스틱 접시와 그릇에서 시작해 음식과 함께 씹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얇은 숟가락과 포크(태국 간이식당에서는 모두 이 숟가락과 포크를 사용한다), 물컵과 물통, 얼음통과 재떨이, 심지어 각 테이블 옆에 놓여 있는 작은 쓰레기통에 이르기까지 모든 용품을 현지에서 그대로 공수해왔다. 이러한 재현이 얼마나 완벽했던지, 즉석에서 스마트폰으로 현장 사진을 찍어 태국 친구에게 보내니 ‘우치, 지금 방콕이야?!’라는 답장이 올 정도였다. 음식도 간이식당 스타일을 잘 살리고 있다. 대표적인 태국 음식인 톰양쿵만 보더라도 그렇다. 플라스틱 그릇에 무심히 담아낸 톰양쿵은 태국인들이 즐기는 탁라이(레몬그라스)와 카(갈랑갈)를 듬뿍 넣어 진한 향미를 낸다. 새우와 오징어를 주재료로 사용하고 칼칼하게 맛을 낸 이 톰양쿵은 현지 간이식당에서 판매하는 서민적인 톰양쿵 맛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돼지고기 간 것을 바질과 함께 짭짤하게 볶아낸 팟카파오무도 신선하다. 팟카파오무는 태국에서는 대중적인 반찬이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생소한 음식이다. 여기에 ‘태국의 소주’(실제로는 럼이다)라고 불리는 ‘쌤썽’ 한 잔을 곁들이면 이곳은 더 이상 서울이 아닌 방콕의 한 골목이 된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두 명의 한국인 젊은이에 의해 꾸려진 것이라는 점이다. 태국에서 생활하며 현지 식당에서 요리 수업을 쌓은 대표와 태국을 내 집 드나들듯 오가던 그의 ‘절친’이 손잡고 탄생시킨 까올리 포차나는 태국 특유의 코드를 고스란히 보여주면서도 트렌디하게 풍자하고 있다. 태국 간이식당의 ‘솔’을 그대로 지닌 채 말이다.

info
메뉴 톰양쿵 1만 8천원, 팟타이1만원, 카오팟 뿌(게살볶음밥) 8천원, 깽끼오완(그린커리) 1만 3천원, 쌤썽(태국럼) 2만5천원
영업시간 18:00~05:00
위치 용산구 이태원동 706
문의 010-9019-1995

전우치
음식칼럼니스트, 에디터, 신문기자, 방송작가, 여행기자, 영상 디렉터, 프로젝트 디렉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온 콘텐츠 제작 전문가다. 클럽컬처매거진
지난 1월 초, 경리단 길에서 새벽 술자리가 있다기에 늦은 시간 옷을 주섬주섬 주워 입고 집을 나섰다. 눈이 한창 내린 뒤라 길은 미끄럽고 날은 추웠다. 잔뜩 옷을 여미고 총총걸음으로 걷다보니 머릿속엔 ‘술자리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어디 따뜻한 나라로 튈까?’라는 생각이 가득 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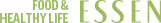










 0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