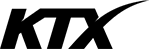-
심사정 필 ‘촉잔도권’의 가로 길이
유독 눈길을 끈 대작 ‘촉잔도권’. 오늘날 중국 쓰촨성에 해당하는 지역인 촉으로 가는 길을 묘사한 관념산수화다. 가로 8미터가 넘는 화면임에도 풍경을 이루는 요소들이 리드미컬하게 대별되어 지루할 틈 없다. 서울 간송미술관의 아담한 전시실에선 펼치기 어려웠지만, 이곳에선 온몸을 활짝 열어 관객을 맞는다.
-
설립 이래 첫 분관이 생기기까지 햇수
16세기 화가 이징의 ‘설산심매’, 즉 ‘눈 쌓인 산에서 매화를 찾다’는 관람객이 대구간송미술관에서 가장 처음 만나는 작품이다. 아마도 혹독한 시절에 봄날을 그리며 문화유산을 수집하던 간송 전형필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았을까. 간송미술관의 전신인 한국 최초 사립 미술관 보화각이 설립된 지 꼭 86년을 맞는 해, 간송미술문화재단의 유일한 상설 전시 공간인 대구간송미술관이 탄생했다.
-
다섯 개 전시실과 하나의 방
‘월하정인’과 ‘야묘도추’가 이웃한 회화 중심의 전시실 1, 오직 ‘미인도’와 <훈민정음 해례본>을 위한 별도 감상 공간인 전시실 2와 전시실 3, 도자·서예·불교미술을 망라한 전시실 4, 이 모든 작품을 실감 영상 ‘흐름·The Flow’로 집약한 전시실 5, 위대한 컬렉터의 삶을 엿보는 ‘간송의 방’까지. 모든 공간, 모든 경험이 짜릿하다.
-
<훈민정음 해례본> 수집 당시 가격
조선어학회 사건이 일어난 이듬해인 1943년, 간송은 <훈민정음>이 경북 안동의 서고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당시 기와집 열 채 값인 1만 원을 지불해 입수했다. 이는 판매자가 처음 제시한 금액의 열 배다. 간송의 신념은 확고했다. “귀한 물건은 제값을 치러야 한다.” 6·25전쟁으로 피란길에 올랐을 때도 그는 책을 몸에 꼭 붙인 채 지켜 냈다. <훈민정음>에 해례가 붙어 있다 해서 해례본, 또는 원본이라 부르는 책. 기적 같은 문화유산을 눈앞에서 본다. 전시실 3에서 열리는 <훈민정음 해례본: 소리로 지은 집>전은 해례본 진본과 더불어 청각장애인·다문화가정 등 특정 환경에서 문자를 사용하는 이들의 풍경을 현대미술 작품에 담았다.
<KTX매거진>의 모든 기사의 사진과 텍스트는 상업적인 용도로 일부 혹은 전체를 무단 전재할 수 없습니다. 링크를 걸거나 SNS 퍼가기 버튼으로 공유해주세요.
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