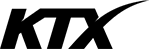“세상에 교복같이 편리한 옷도 없다. (중략) 게다가 교복은 작업복, 운동복, 나들이옷, 때로는 잠옷으로도 겸용된다. 비 오는 날이나 눈 내리는 날에도 입을 수 있는 편리복(便利服)이다.” 1965년 한 신문의 기사다. 요지는 한 벌 마련해서 4년을 장소와 날씨 관계없이 편하게 입어야 할 교복을 요즘 대학생이 통 안 입어 문제라는 것. 그랬다. 한때는 대학생까지 교복을 입었다.
한국의 중고등학교 대부분이 교복을 채택하기에, 새 학기를 맞은 학교 주변은 교복 물결이 넘실댄다. 어른들에겐 과거를 떠올리며 미소 짓게 하는 풍경이다. 정작 본인의 교복 시절엔 친구와 같은 옷을 입는다는 친밀감에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겠고, 갑갑해서 벗고 싶다는 사람도 있었을 테지만.
교복은 어른이 정해 미성년자가 입는 옷이다. 지식과 사회성을 갖춘 성인으로 키우기 위해 교실에 모아 놓고 교육하면서 복장을 통일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학생으로서 신분을 자각해 규율을 지키고 일체감‧소속감을 갖게 하는 동시에 교사 등 어른 입장에서는 소위 ‘관리‧감독’하기가 용이했다. 일찍이 영국의 사립학교나 조선의 성균관도 복장 규정을 두었는데, 입학이 까다로운 데다 경제활동이 아닌 학문에 시간을 보내는 일 자체가 특권이어서 이 복장을 자부심으로 여겼다.
최초의 근대 교복은 1886년 설립한 이화학당이 도입했다. 무채색 거리에서 여학생이 붉은색 치마저고리 차림으로 지나갈 때 사람들 눈길을 끌었을 풍경이 눈에 선하다. 1897년 배재학당은 처음으로 서양식 의복과 모자를 지정했다. 일제강점기에는 한복과 일본식 교복이 공존하다 1937년 중일전쟁 이후에는 총동원 체제하에 남학생 교복을 군복화하고 여학생은 ‘몸뻬’라 부르는 작업 바지를 강제하기도 했다. 해방이 되자 다시금 일본식 교복이 돌아온다. 남학생은 단추를 목까지 채운 검정 상하복, 여학생은 세일러복. 수많은 영화‧드라마에 나와 익숙하고, 전국의 ‘그때 그 시절’을 추억하는 교복 대여점에서 내놓는 그 교복이다.
1980년대 잠시 자율화 시대를 거쳐 교복도 변화를 맞는다. 바지통을 줄이고, 치마를 짧게 하는 등 학생은 주어진 조건 속에서 나름의 아름다움을 추구해 나갔다. 불편한 재킷과 치마‧바지 대신 체육복이나 생활복으로 살길을 도모하는 학생의 요구를 반영해 티셔츠와 후드 점퍼가 교복으로 등장하고, 여학생도 바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한복 교복을 채택하는 학교 또한 생겨났다.
여전히 교복은 어른이 정한 대로 미성년자가 입어야 하는 옷이나, 실소비자인 학생의 목소리를 이만큼이나마 반영한 것은 다행이다. 봄처럼 예쁜 청춘들이 교실과 교과서, 교복 등 온갖 ‘교(敎, 校)’에 갇혀 봄인 줄도 모르고 지나치면 얼마나 아쉬운 일인가. 가르침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겪고 배워 나가는 동료로서, 교복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더욱 세심하게 귀를 기울일 때다.
<KTX매거진>의 모든 기사의 사진과 텍스트는 상업적인 용도로 일부 혹은 전체를 무단 전재할 수 없습니다. 링크를 걸거나 SNS 퍼가기 버튼으로 공유해주세요.
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