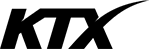화가는 고개를 약간 숙인 채 눈을 치켜떴다. 거친 선으로 그은 작은 스케치임에도 자화상에서는 그의 고집스러움, 도전 의식, 불안함 같은 내면의 단어가 흘러나왔다. 자화상 옆과 아래에는 손을 그렸다. 무언가를 잡은 손, 어딘가를 짚은 손, 필기구를 잡은 손, 허공에 놓인 손. 언제든 모델 삼을 수 있고 기본기를 익히기에도 유용한 존재들. 1900년경 스케치라 하니 아직 10대 시절이다. 미래란 항상 희망과 두려움을 동시에 품은 단어이나 열여덟 살 화가 지망생 에드워드 호퍼에겐 두려움이 더 우세했을지도 모르겠다. 어떤 내일이 기다리는지 불확실한 오늘, 그는 자신의 모습과 손을 스케치했다. 이 습작이 한 발 한 발 그를 생의 다음 단계로 이끌 것이므로. 시간이 충분히 흘러 그가 어떤 길의 궤적을 그리며 살아갔는지 아는 지금, 서울시립미술관 <에드워드 호퍼: 길 위에서> 전시장을 찾아 열여덟 소년의 출발점에 섰다. 위대한 화가의 시작은 평범하게도 종이에 펜, 잉크, 연필, 콩테였다.
습작과 청춘 시절 작품이 건네는 말
호퍼의 전 생애를 아우르는 전시는 7개 섹션으로 나뉜다. 화가의 정체성을 탐구하는 ‘에드워드 호퍼’부터 그가 여행하거나 머무른 ‘파리’ ‘뉴욕’ ‘뉴잉글랜드 지역’ ‘케이프코드’ 같은 지역 이름을 거쳐 동반자인 ‘조세핀 호퍼’를 짚고 ‘호퍼의 삶과 업’으로 마무리하는 구성이다. 첫 번째 구역 ‘에드워드 호퍼’에서는 스케치와 자화상, 그가 살았던 공간을 그린 작품을 모았다. 초기작은 물론 1943년, 육십이 넘어서도 손을 묘사한 스케치가 함께 놓였다. 화가로서 성실함을 끝까지 잃지 않았다는 증거다. 이런 스케치는 대표작 몇 점 가지고는 알아차리기 어려운 사실을 발견하게 한다. 각각 다른 나이대의 자화상도 인상적이다. 화가는 대체 얼마나 용감하기에 자기 자신을 캔버스에 옮기는 것일까. 그림이 무언가를 전달한다면, 관람객이 자화상 속 화가에게서 무엇을 볼 줄 알고. 그럼에도 화가는 표정을 정하고 붓을 든다. 화가만이 할 수 있는 솔직하고 용감한 고백의 방식. 이 고백 내용을 들으려 화가와 오래 눈을 마주쳤다.
삶의 방향을 그림으로 정한 미국 태생의 호퍼는 당시 예술 중심지인 프랑스 파리를 1906년부터 1910년 사이에 세 번 방문한다. 이때의 경험과 기억이 ‘파리’ 섹션을 이루는데, 인상파를 연상시키는 풍경화에서 빛의 효과를 모색하고 고유한 구도를 찾아나가는 흔적이 드러난다. 20대, 무엇을 어떻게 그려야 할지 하루는 선명해졌다가 다음 날은 좌절하고 다시 의지를 다졌을 날들. 그림을 보면서 대가의 20대 청춘을 상상한다. 이 역시 ‘대표작’만 들여온 전시장에서는 느끼기 힘든 감상이다. 물론 파리 풍경이나 실내를 표현한 그림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파리를 세 번 여행한 호퍼는 세 번 돌아왔고, 미국 뉴욕에 평생 정착한다.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그 호퍼의 작품이 펼쳐질 참이다.
우리는 모두 고독하다는 진실
생계를 위해 호퍼는 잡지와 광고 삽화 작업을 하며 동판화에 관심을 갖는다. 당시 미국은 고층 건물과 철도 등을 한창 짓는 중이었다. 사람들은 고가 전철을 타고 출퇴근하고, 휴일엔 기차를 이용해 여행을 떠나 호텔에 머물렀다. 새로운 일상, 나날이 변화하는 도시. 호퍼는 길 위에서 도시와 사람을 응시했고, 고가 전철에 올라 이전과 달라진 눈높이로 관찰하기도 했다. 이를 새긴 판화가 ‘뉴욕’ 섹션 초입을 장식한다. 1921년 작 ‘밤의 그림자’는 동판화의 흑백이 빚어낸 빛과 그림자가 과감하고도 드라마틱한 구도를 완성한다. 크지 않지만 그 안의 이야기가 궁금해져 관람객을 빨아들이는 작품이 호퍼의 그림 세계를 예고한다.
분명 그림에 빛이 들건만 희망차기보다는 고요하고 기묘한 느낌이 흐른다.
일상을 영위하기 위해 저 밑바닥에 꾹꾹 눌러 두고
외면한 고독이 호퍼의 빛 아래서 드러난다.
이성복 시인의 시 ‘그날’이 떠오른다.
“모두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서울시립미술관이 서소문본관에서 <에드워드 호퍼: 길 위에서>전을 열고 있다. 작가의 전 생애에 걸친 드로잉, 판화, 유화, 수채화 160여 점과 사진, 편지 등 자료 110여 점을 일곱 개 섹션으로 나누어 선보이는 대형 전시다. 20세기 초·중반 변화하는 세계를 담은 그림은 소재가 풍경이든 인물이든 하나하나가 시간을 넘어 오늘날 바로 우리의 초상이기도 하다. 기간은 8월 20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이 서소문본관에서 <에드워드 호퍼: 길 위에서>전을 열고 있다. 작가의 전 생애에 걸친 드로잉, 판화, 유화, 수채화 160여 점과 사진, 편지 등 자료 110여 점을 일곱 개 섹션으로 나누어 선보이는 대형 전시다. 20세기 초·중반 변화하는 세계를 담은 그림은 소재가 풍경이든 인물이든 하나하나가 시간을 넘어 오늘날 바로 우리의 초상이기도 하다. 기간은 8월 20일까지.
높은 곳에서 저편의 건물 실내를 엿보는 듯한 1928년 작 ‘밤의 창문’, 어둑한 시각에 건물과 그 뒤의 숲까지 함께 담은 1935년 작 ‘황혼의 집’ 등이 이어진다. 빛과 어둠이 강렬한 대비를 이루고, 인물은 등장하더라도 그림의 주인공이 아닌 익명의 누군가가 된다. 그렇기에 나, 너, 누구라고도 여겨질 수 있는 존재. 호퍼는 휴양지인 케이프코드를 매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남긴 1948년 작 ‘오전 7시’나 1960년 작 ‘2층에 내리는 햇빛’도 같은 분위기다. 분명 빛이 들건만 희망차기보다는 고요하고 기묘한 느낌이 작품에 흐른다. 일상을 영위하기 위해 저 밑바닥에 꾹꾹 눌러 두고 외면한 고독이 호퍼의 빛 아래서 드러난다. 호퍼가 어떤 번듯한 풍경을 그렸더라도 관람객은 단순히 그림의 피사체를 넘어 심연을, 이 세상과 사람의 외로운 본질을 맞닥뜨린다. 이성복 시인의 시 ‘그날’이 떠오른다. “모두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화가가 그림을 그린다 해도 작품이 관람객과 만나는 데에는 여러 절차가 필요하다. 마흔 넘어 결혼한 호퍼의 아내 조세핀 니비슨 호퍼는 그의 훌륭한 조력자였다. 역시 화가였던 그는 내향적인 남편 대신 외부 인사를 상대하고 미술계와 연결해 주었다. 호퍼의 작품을 일일이 장부에 정리했고, 호퍼의 그림에 등장하는 대부분 여성의 모델이 되기도 했다. 그러느라 본인의 화가 인생은 접어야 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여섯 번째 섹션 ‘조세핀 호퍼’에 전시한 1961년 작 ‘햇빛 속의 여인’은 아내를 향한 존경의 표현이었을까. 20세기 초・중반, 나 자신보다는 ‘화가의 아내’로 살아간 여성의 삶을 짚어 본 뒤 마지막 일곱 번째 섹션에서 호퍼의 삽화와 다큐멘터리를 관람한다. 서울시립미술관 세 개 층에 85년을 살다 간 화가의 65년에 걸친 예술 세계를 충실히 압축해 놓았다.
언제나 아름답고 영원히 유효할 작품들
미술관 2층에는 <영원한 나르시시스트, 천경자>전과 <80 도시 현실>전을 진행 중이다. <영원한 나르시시스트, 천경자>전은 자신의 그림이 흩어지지 않고 시민에게 영원히 남겨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화백이 기증한 작품 93점 중에서 20여 점을 추려 선보인다. 내가 지금 여기 있다고, 이렇게 슬프고 뜨겁고 아름다운 존재라고 도발하듯 외치는 작품이 강렬하다. <80 도시 현실>은 가나아트 기증 작품과 미술관 소장품에서 1980년대 도시 현실과 도시인을 주제로 한 21점을 모았다. 김정헌・민정기・이상국 등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가 급격한 도시화로 변해 가던 시기에 도시, 자연, 사람을 자기만의 눈으로 응시하고 해석한 작품들이다. 이 해석은 1980년대에나 지금이나 귀 기울일 가치가 충분하다.
예술은 알려 주고, 알아준다
무엇이 그림이 되는가. 우리는 일상에서, 길 위에서 끊임없이 보고 듣고 때로는 기억하고 때로는 지나친다. 그 가운데 어느 것이 대화나 기록할 거리로 남고 어느 것이 버려지는가. 호퍼의 소재는 평범한 극장・식당・집・호텔・가게・사무실・기차와 그곳의 사람이었으나 그가 그림에 담은 본질은 빠르게 달라지는 세상에서 문득 낯설어진 풍경이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 문득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괜찮은지 되뇌는 질문이다. 길 위에 나서서 평생을 관찰해 존재의 고독을 빛과 어둠으로 표현한 호퍼. 그렇다고 작품이 마냥 쓸쓸하지는 않다. 어쩌다 잠깐 고독했던 이가 이런 그림을 그렸을 리 없다. 내 깊은 데 덮어놓고 모른 척하던 구석을 알려 주고, 알아주는 그림이라는 뜻이다. 샤워하듯 세례 받듯 예술의 기운으로 마음을 씻고 나오는 길, 배형경・이우환・최우람 작가 등의 야외 조각 작품이 미술관과 바깥세상의 경계에 서서 배웅한다. 오늘이라는 길 위에서는 또 무엇이 그림이 될까. 일단 성실하게 연필부터 쥘 일이다.
호퍼는 평범한 일상을 관찰해 그 안의 쓸쓸함을 그림에 옮겨 왔다.
고독한 우리는 그의 그림에 고인 고독을 보면서 위로받는다.
세례를 받듯 예술의 기운이 마음을 씻어 준다.
<KTX매거진>의 모든 기사의 사진과 텍스트는 상업적인 용도로 일부 혹은 전체를 무단 전재할 수 없습니다. 링크를 걸거나 SNS 퍼가기 버튼으로 공유해주세요.
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