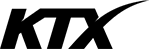바다가 있다. 시린 바람이 무시로 쓸고 지나가도 수면에 번지는 물결은 잔잔해 봄날 나뭇가지 같다. 망울인 양 물결에 매달린 배들이 땅과 땅 사이를 흔들어 바다에 줄을 긋는다. 배가 오가는 자취를 따라 망울이 터지고 잎이 벌어진다. 멀리서는 울창하게 핀 섬들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햇살을 머금듯 수평선을 휘감아 덮었다. 풍경은 이렇게 약동하는데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바다는 묵묵해서 높게 자라난 자신의 길고 긴 여정을 내비칠 뿐이다. 깊이 뿌리내려 굳건한 나무, 목포에는 바다의 이야기가 있다.
물결이 봄날 나뭇가지 같은 줄무늬를 수면에 긋고, 섬들은 숲인 듯 울창하게 떠 있다. 목포 바다가 약동한다.
+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용산역에서 KTX를 타고 목포역까지 2시간 30분 정도 걸린다.
목포해상케이블카에서 내려다본 바다
어느 도시든 역사에 굽이가 없겠느냐만 한때 목포엔 시대의 격랑이 통째 몰아쳤다. 조선 시대까지는 유달산 자락이 중심인 그리 크지 않은 고을이었다. 서해와 내륙을 잇는 영산강 뱃길의 들머리이기에 요충지로 주목받았어도 한반도 흥망사에서 주역으로 등장하는 일은 드물었다. 그러다 1897년 목포항이 열렸다. 부산, 원산, 인천에 이은 네 번째 개항장이었으며, 외세가 강요해서가 아닌 왕이 칙령을 내려 도모한 첫 번째 개항장이었다. 정부는 해관을 설치해 관세 수입을 늘리고자 했고 감리서를 두어 자주국으로서 외교를 꾀했다. 나라가 나라의 주권을 빼앗는 광풍이 세상을 할퀴던 시절, 목포는 존립으로 가는 들머리가 되었다. 하지만 희망은 여러 갈래로 퍼질지언정 역사는 외길을 걷는다. 익히 아는 바대로 우리가 주시한 목포를 침략자 또한 눈여겨보았다. 항구를 저열한 욕망의 도구로 삼은 일제가 제 나라 사람과 시설을 부어 넣었다. 목포는 손꼽히는 거대 도시로 성장했으나 숱한 이가 내쫓겨 터전을 겉돌았다. 시대의 격랑은 사무치도록 격렬했다.
다시 바다는 묵묵하다. 북항스테이션에서 목포해상케이블카를 타고 유달산을 넘어 나아간다. 최고 155미터 상공에선 다 아스라해 풍경이 하나로 다가온다. 유달산에서 양을산에 이르는 광활한 공간에 도시가 그득하고 영산강은 삼학도에서부터 서서히 바다로 빠진다. 대양에서 몰려오는 파랑을 끊어 내는 섬들이 목포대교와 육지 틈새 바다를 고요히 어른다. 바람이 수면에 계속 줄무늬를 그리건만, 깊이 뿌리내린 나무처럼 목포는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는다. 격렬했던 옛일을 저기 두어 개, 다른 어디엔 더 많이 간직하고도 다만 오늘을 해사하게 보여 준다. 어찌 아니 아름다울까. 한낮의 볕살이 때맞춰 바다에 내려앉는다.
유달산과 고하도 앞바다에 한낮의 볕살이 내려앉는다. 갯바람이 불어오지만 목포의 풍경엔 온기가 어려 있다.
목포해상케이블카는 왕복 거리가 무려 6.46킬로미터다. 주탑의 최고 높이 155미터 역시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수준. 길이와 고도를 통해 짐작은 되어도, 케이블카가 선사하는 비경은 이렇듯 예상을 가볍게 넘어선다. 북항스테이션에서 출발해 유달산 정상부와 고하도를 거쳐 기점으로 돌아오는 40분간 목포를 고이 보여 주는 것이다. 유달산과 고하도에도 스테이션이 놓인 덕분에 각각 하차한 뒤 걸어서 주변을 감상할 수 있다. 공중에서 감탄스럽게 마주한 목포의 속살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다. 유달산을 오른다. 정상은 해발 228미터로 이 땅의 산으로서 높다고 말하긴 어렵다. 더구나 스테이션은 중턱에 자리하기에 목적지인 마당바위는 여기서 가깝다. 굳은 겨울 산을 밟아 갔다. 길옆이 돌과 나무로 연이어 겉모양을 바꾸며 얼마간 시야를 가린다. 능선이 낮아지고, 숲이 물러나고, 바라보이는 경계가 확장하는 어느 때 마침내 마당바위에 도착했다.
유달산은 보여 준다. 해가 빛을 내려 물들이는 윤슬의 바다, 그리고 대지가 품어 보살피는 인간의 삶을.
유달산이 건네는 목포의 비경
정상인 일등바위 바로 아래, 이곳에선 무엇도 눈길을 막지 않는다. 서쪽엔 해가 빛을 내려 물들이는 바다, 동쪽엔 대지가 보살피는 인간의 삶이 가없이 펼쳐진다. 빛 물결이 일렁이는 바다를 목도하면서 차마 고개 돌리지 못해 오래 서 있었다. 한 시절 치열하게 흔들리고도 이토록 영화로워 눈물겨운 도시가 등 뒤에서 따듯한 숨결을 보낸다.
눈길이 닿는 데마다 무해한 풍경이 날아드는 유달산을 감히 해발만으로 말하겠는가. 바다는 바다대로, 도시는 도시대로 순백 같은 저를 기대 의지하니, 유달산은 가장 무구한 산일지 모른다. 낱낱이 이어지는 모든 정경 앞에서 뒤엉킨 마음은 해로운 감정들을 떨친다. 멀리 등마루 위를 통과하는 케이블카 하나가 억센 갯바람에 기우뚱하다 곧 자세를 바로잡고 경관을 가로지른다. 목포가 기어코 찬란한 것처럼. 그 품에서, 우리도 목포가 되어 간다.
땅과 사람이 함께 쓴 글, 목포문학관
극작가 김우진·차범석, 소설가 박화성, 문학평론가 김현.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이미 가슴은 벅차오른다. 당대에 명성을 드날리고도 세대를 뛰어넘어 지금껏 찬사를 받는 문인들을 목포가 길렀다. 수탈당한 과거로부터 유달산의 꿋꿋한 현재까지, 넘어지고 일어나고 전진하는 이곳 사람들의 궤적이 양분이 되었으리라. 삼학도 인근에서 2007년 문을 연 목포문학관은 그런 네 거장의 삶을 유족과 지인이 기증한 유품·자료로 내보인다. 1층 만남의 홀 왼쪽은 차범석관이다. 민중을 세심히 들여다본 선생은 <산불> <불모지> 등에서 억압과 그에 따른 고통을 철저하게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수많은 잡상인이 득실거리는 현실 속에서 오늘이 나아가야 할 길”을 묻고 답을 모색한 흔적이 저 원고지들에 남았다. 질문은 여전히 매섭게 시대를 꿰뚫는다. 언젠가 뜻이 모인 대답이 반대로 우리의 아둔함을 꿰뚫어 주기를, 질문을 다시 모두에게 던지고 차범석관을 나선다.
박화성 선생은 일제강점기, 그를 이어 산업화가 지상 목표였던 시기를 “펜 하나로 꿈을 그려 낸 세한의 송백”인 듯 굳게 살았다. 부조리를 조리로 포장하는 세상이었다. 여성에게 세상이 강제한 굴레를 <추석 전야> <벼랑에 피는 꽃> 등 작품 속 각성하는 여성을 통해 부수어 갔다. 성별 양상으로 치부해 외면하는 세간 한구석 좁은 견해를 벗어난 문제의식은, 차범석 선생과 같이 오늘이 가야 할 길을 가리킨다. 글이 빼곡한 목포문학관을 걸으며 극예술을 선도한 김우진, 평론을 문학으로 끌어올린 김현 선생의 삶을 내리읽는다. 저마다 일가를 이룬 발군의 혼이 목포에서 피어났다. 유달산을 닮은 향기가 문학관 앞 영산강을 거슬러 내륙으로 번진다. 세한의 송백과 다름없이 굳게, 그래서 기어코 찬란한 길을 향해서.
목포문학관은 목포가 기른 문인 김우진, 박화성, 차범석, 김현과 관련한 유품과 자료를 전시한다. 문예대학 등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문의 061-270-8400
배가 저녁과 밤의 갈림목을 항해한다. 하늘이 석양에 붉게 물들어 가고, 목포는 다가오는 밤을 차분하게 준비한다.


삼학도크루즈는 삼학도 계류장에서 출항해 목포 해상케이블카를 거쳐 목포대교 인근 바다까지 간다. 월요일을 제외한 평일은 두 차례, 금요일과 주말엔 세 차례 운행한다. 문의 061-245-3222

삼학도크루즈는 삼학도 계류장에서 출항해 목포 해상케이블카를 거쳐 목포대교 인근 바다까지 간다. 월요일을 제외한 평일은 두 차례, 금요일과 주말엔 세 차례 운행한다. 문의 061-245-3222
목포와 눈을 맞추고, 삼학도크루즈
하늘이 붉은 햇무리에 젖어 든다. 차가운 공기가 동녘에서 어둠을 잡아당긴다. 가매지는 바다는 더 짙은 내음을 땅으로 흘려보낸다. 밤이 오고 있다. 오차 없이 뜨고 지는 해를 날마다 목격하면서도 내일을 의심하는 우리의 미련스러운 오차. 불멸할까 봐 두렵게 여기는 어둠이이야말로 뜨겁게 산 이날을 보상하는 휴식이자 담날이 오리라는 약속이었던 것을. 봉우리 셋이 옹기종기한 삼학도에 들어 밤을 준비한다. 공기는 차가우나 어둠이 곱다.
삼학도 계류장에 도착해 삼학도크루즈를 탔다. 이른 오후에도 운항하지만 케이블카의 하늘과 유달산의 땅, 그리고 바다를 차례로 만나고 싶어 이 시간을 선택했다. 눈높이를 맞춰 가는 동안 목포는 점점 깊어지겠으니. 오후 5시, 배가 부두를 떠난다. 선내에서 몸을 녹이다 부두를 다 빠져나갈 즈음 뱃마루로 나왔다. 겨울이 오롯하다. 옷깃을 여미고 숨을 들이쉰다. 사느란 기운이 손끝까지 퍼져 몸이 움츠러든다. 뱃마루에 머무르기로 한다. 편하자고 비켜나서 마주하지 못한 순간 중 몇몇은 아마 그다음을 결정짓는 계기였을 것이다. 바다는 시나브로 어두워지는데, 집집이 불을 밝힌 도시가 환하다. 어스름이 사근사근 유달산 서쪽으로 제 몸을 옮기고, 어스름보다 검으나 밤은 아닌 하늘이 반대편을 휩싼다. 배는 계속 저녁과 밤의 갈림목을 항해한다. 유달산, 고하도 곁을 스치고는 목포대교에 다다를 무렵 서쪽이 전부 검어졌다. 밤이 왔다. 사방이 빛을 낸다. 목포를 완전하게 마주하는 결정적 순간이다.
어둠 안에서 땅이 바다에 배어들고 바다는 하늘에 스며들어 목포는 오로지 빛이다. 조명을 켠 목포대교와 목포해상케이블카, 육지에 점점이 뜬 마을의 불빛, 하늘엔 달빛. 밤바다는 더욱 묵묵해 배가 미끄러지는 소리만 흩어지고 있다. 여기는 야단스러울 만큼 휘황해서 유흥하기 좋아도 헤어지면 잊히는 거리와 다르다. 이 밤, 이 바다에서는 아무것도 자신을 드러내려 애쓰지 않는다. 억지스레 입꼬리를 올린 표정도, 과장해 떠벌리는 이야기도 없다. 목포의 빛은 잠잠한 밤바다를 감돌며 조금씩 마음으로 다가온다. 어느덧 하늘이 사람이고 사람이 땅이다. 바다는 가만가만 모두 비추어 흐른다. 헤어져도 기억할 지금.
바다, 별 그리고 약속
배는 목포대교 인근 바다에서 방향을 바꿔 삼학도로 돌아간다. “보이지? 저기야.” 뱃마루에 서서 함께 풍경을 바라본 낯모르는 누군가가 일행에게 말했다. 다시금 함께 고하도 한편을 바라본다. 아득한 그곳에 정말 세월호가 있었다. 2017년 바닷속에서 올라온 세월호는 목포로 인양됐고 3년 뒤 고하도에 영구 보존하기로 결정되었다. 위에서 계획해 지시하고 아래에서 받드는 행정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2020년, 그해 목포 주민들은 스스로 영원히 간직하겠다고 결정했다. 그래야 한다 믿었기 때문이다. 출발할 때보다 차가워진 공기가 삼학도 가는 배에 눈처럼 내린다. 밤의 도시가 별빛 같아서 우리는 차가운 공기 속을 오래도록 지켰다. 삼학도에 가까워지자 배는 엔진을 끄고 물결에 저를 맡겨 느리게 나아갔다. 도시가 천천하게 영롱해지는 광경은 정녕 아름다웠다. 약속해 주듯이 그렇게, 목포의 밤이 반짝였다.
어둠이 찾아온 목포, 바다는 밤빛을 담는다. 목포의 빛이 잠잠한 밤바다를 감돌며 조금씩 마음으로 다가온다.

<KTX매거진>×MBC 라디오 <노중훈의 여행의 맛>
목포에 다녀온 <KTX매거진>이 MBC 표준FM <노중훈의 여행의 맛>을 통해 독자, 청취자 여러분과 만납니다. 기자의 생생한 목소리로 취재 뒷이야기, 지면에 미처 소개하지 못한 여행 정보를 함께 들려 드립니다.
* 1월 7일 오전 6시 5분(수도권 95.9MHz)
Mokpo, Stories of the Sea
The waters off Mokpo, Jeollanam-do Province share stories that touch the heart.
The ripples on the water, even after a burst of cold winds, are gentle and tender. The boats that bob up and down are like buds hanging on a branch in spring. The buds soon burst and unfold, following the tracks of the vessels. The islands dotting the horizon are basking in the golden sun. The scene is throbbing with life, but no sound can be heard. The sea, in its silent confidence, unveils its glorious journey. In Mokpo, the stories of the sea go deep down like the roots of a sturdy tree.
A Bird’s-Eye View of Mokpo
From Bukhang Station, I boarded the Mokpo Marine Cable Car, and crossed over Yudalsan Mountain and the sea. At a height of 155 meters, the scenery is simply spectacular. The city fills the vast space between Yudalsan Mountain and Yangeulsan Mountain, and Yeongsangang River leads out from Samhakdo Island to the ocean. The islands that help break the waves calm the waters between Mokpodaegyo Bridge and the mainland. Like a tree with deep roots, Mokpo remains peaceful despite the winds and ships leaving the surface rough and choppy. I get off the cable car at Yudalsan Station, and begin my ascend up the 228-meter-tall Yudalsan Mountain.
There are no words to describe the view from the mountain. To the west is the sea glowing in the sun, and to the east is the lives of humans supported by the land. Wherever my gaze falls, I am blessed by the most beautiful and harmless of sights. Yudalsan Mountain, which the city and the sea are dependent on, is an immaculate presence. As you take in the surroundings, you will find yourself letting go of worldly concerns. In the distance, a cable car tilts in the wind, but soon returns to its normal angle, as though mirroring Mokpo’s brilliance and determination. Here, you will naturally develop a bond with the city. Mokpo Literature Museum showcases the lives of Kim U-jin, Park Hwa-seong, Cha Beom-seok, and Kim Hyeon–writers who left their mark in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The articles donated by their family and acquaintances attest to the brilliance of the four Mokpo-bred writers.
Coming Alive at Night
In the evening, I opted for the Samhakdo Cruise. As darkness falls over the sea, the city brightens up. The moon shifts over to the east side of Yudalsan Mountain, and a sky darker than dusk but not fully night envelops the opposite side. The lit-up Mokpodaegyo Bridge, street lights in the village, and the moonlight in the sky form a harmonious scene. Out at the quiet sea, the sound of drifting boats fills the air. The dazzling nightscape of Mokpo is deeply imprinted in my mind.
목포에서 여기도 가 보세요
-
볼거리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일제강점기에 수탈의 거점으로서 아픈 세월을 보낸 목포. 일제가 세운 건물들은 해방 이후 일부 없어졌지만, 목포는 잊지 않고 후대에 알리고자 남은 건물을 보존했다. 구 목포 화신연쇄점, 구 동아부인상회 목포지점, 구 목포부립병원 관사가 대표적이다. 당시 모습이 생생한 건물과 예스러운 거리는 역사를 기억하는 교육의 장이자 여행지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 2018년에 최초로 선·면 단위 문화재로 등록된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은 최근에는 목포해상케이블카와 함께 ‘2023~2024 한국관광100선’에 선정됐다.
문의 061-270-3542 -
볼거리 서산동 시화골목
고단한 가운데에도 내일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았던 이들의 터전이 유달산 비탈에 자리한다. 바다에서 건져 올린 물고기를 터벅터벅 옮기고, 보리도 타작하면서 꿋꿋하게 일상을 일군 주민들. 2015년에 목포 지역 시인과 화가가 주민의 삶을 시와 그림으로 표현했다. 벽에 그림을 입혔고 시화 목판 작품을 골목에 설치했다. 정겨운 골목 분위기와 어우러지는 카페와 갤러리, 공방까지 들어서면서 서산동 시화골목은 목포 여행 코스 중 하나가 되었다. 고하도는 물론이고 전남 영암이 보이는 조망도 이 골목의 자랑이다.
문의 061-270-8432
-
먹거리 오미락
목포를 방문한 귀한 손님에게 가장 목포다운 맛을 보여 주고 싶을 때, 많은 사람이 ‘오미락’을 떠올린다. 그만큼 명성 높은 이 집은 철마다 회를 중심으로 다채로운 메뉴를 선보이는 향토 음식점이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과 미국, 일본에서 조리 실력을 뽐낸 배성민 대표가 홍어, 낙지, 아귀, 민어 등을 상에 올린다. 배 대표는 회를 더 맛있게 만들고자 수심이 깊고 조류가 빠른 바다에서 사는 물고기만 선별해 사용한다. 수입산은 하나도 쓰지 않고 쌀을 포함한 모든 재료를 지역에서 조달하는 뚝심도 대단하다.
문의 061-287-8892 -
먹거리 한일생태전문점
생태탕과 청국장을 함께 파는 식당도 드물 것인데, 생태청국장을 만드는 식당은 오죽할까. 김순이 대표는 2007년부터 바로 그 희귀한 생태청국장을 요리했다. 모든 과정은 혼자 진행한다. 국내산 콩을 다섯 시간 삶아서 띄우고 버무리는 과정을 한 번도 남에게 맡긴 일 없이 해 왔다. 기간을 정해서 딱 그만큼 쓸 양만 제조해 신선도를 유지하고, 매일 일곱 가지 재료를 배합해 국물을 우린다. 생태 역시 가족에게 먹일 건강한 재료를 고른다는 마음으로 가져온다. 맛이 없을 수가 없다. 구수하고 담백하고 진하며 깊다.
문의 061-243-9040
<KTX매거진>의 모든 기사의 사진과 텍스트는 상업적인 용도로 일부 혹은 전체를 무단 전재할 수 없습니다. 링크를 걸거나 SNS 퍼가기 버튼으로 공유해주세요.
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