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음식을 사 먹는 우리가 왜 불결하고 해로운
음식을 먹어야 하는가. 우리에게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투명하게 알고, 안심하고 먹을 권리가 있다.
지난 호에서 우리는 음식 윤리가 오랜 역사를 갖고 있음을 알았다. 그렇다면 첨단 과학을 자랑하는 현 시대에 어찌해서 낡을 대로 낡은 음식 윤리에 특별한 관심을 쏟아야 하는가?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유 또한 과학에 있다.
과학은 기술과 공학, 산업의 발전을 이끌었다. 이는 먹거리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데, 영농 기술의 발달과 함께 등장한 농약과 비료 등은 식량 생산을 증가시켰으며 식품산업은 규모가 커짐은 물론 고도로 분업화되었다. 굳이 소를 키우지 않아도, 힘들게 도살하거나 혹은 고기를 직접 조리하지 않더라도 맛있는 스테이크를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세상이 왔다.
어린 시절, 흑염소 여러 마리를 새끼줄에 줄줄이 꼬아 이 동네 저 동네 팔러 다니는 아저씨가 있었다. 아이들은 염소를 따라 다니고 염소들은 메~에 하고 울며 콩자반 같이 생긴 똥을 길가에 흘리고 다녔다. 어느 날 그중 한 마리가 우리 집으로 왔다. 아저씨는 “애들은 가라”며 수돗가에서 무엇인가 작업을 하였고 흑염소의 외마디 비명이 마당을 울린 뒤 부엌 아궁이 가마솥에서는 야릇한 노린내를 풍기는 하얀 김이 무럭무럭 피어올랐다.
대학 시절의 추억도 있다. 양계장을 하던 삼촌 댁에 며칠 머무른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닭백숙, 내일은 닭곰탕, 또 그다음 날은 닭튀김 식으로 매일매일 다양한 닭 요리가 나를 반기기 위해 상에 올랐다. 비록 삼촌이 내 앞에서 닭 모가지를 비틀지는 않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어제는 그 닭이, 오늘은 이 닭이, 내일은 저 닭이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있다는 것을…. 식탁에 오른 닭과 나의 사이는 그렇게나 가까웠다.
인류 역사는 가축 사육의 측면에서 전기사육시대, 사육시대, 후기사육시대로 구분할 수 있다. 전기사육시대에는 동물이 먹을거리이며 동시에 숭배의 대상이었으나, 사육시대에는 인간의 이익을 위한 대상으로 전락하였고, 오늘날의 후기사육시대에 이르러서는 동물의 생명이 철저히 상품화되고 인간과 동물의 완전한 격리가 이루어졌다. 그러니 플라스틱 파우치에 담긴 흑염소중탕을 마신다고 마당을 울리던 흑염소의 비명은 들리지 않고, 치킨버거를 먹는다고 삼촌의 닭이 떠오르지도 않는다. 고기뿐 아니라 초콜릿, 커피 등을 먹어도 땀 흘린 농민의 고통을 느낄 수 없고 포도주를 담근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하지 않다. 과학은 음식을 만들거나 파는 사람과 먹는 사람, 바로 우리를 멀찌감치 떼어놓았다. 부모의 반대로 헤어진 연인처럼 우리는 그 이유도 모른 채 멀어져버렸다.
대학 시절 무감독 시험을 치른 적이 있다. 교수는 제자들이 대학생다운 윤리를 지니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바람과는 달리 아예 강의실을 돌아다니며 서로의 답안지를 베꼈다. 한 번도 커닝한 적이 없는 나도 마찬가지였다. 사람은 그렇게나 무감독과 익명성 앞에 나약한 도덕을 지니고 있다. 서로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의 거리에 떨어져 있는 시대, 감독의 부재와 익명의 시대, 그것이 바로 과학이 초래한 비윤리적 시대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는 맥도널드의 배달원이 햄버거를 배달한 뒤 그것을 시킨 이에게 ‘침 뱉은 거 잘 먹었어?’라는 문자를 보낸 사건이 있었다. 미국에서는 버거킹 햄버거에 의도적으로 묻힌 듯 보이는 침이 발견되어 DNA 검사를 하자 종업원의 것으로 밝혀진 사례도 있다.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음식을 사 먹는 우리가 왜 불결하고 해로운 음식을 먹어야 하는가. 우리에게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투명하게 알고, 안심하고 먹을 권리가 있다. 우리가 음식인에게, 특히 음식을 만들거나 파는 사람에게 음식에 대한 최소한의 윤리적 마인드를 요구하는 이유다. 첨단 과학을 자랑하는 오늘날, 슬프지만 그래서 음식 윤리가 꼭 필요하다.

김석신 교수
서울대학교 식품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식품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가톨릭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공 분야의 오랜 연구를 바탕으로 음식 윤리를 대중에 알려 우리 사회에 올바른 식문화가 정립되기를 바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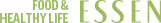










 0
0























